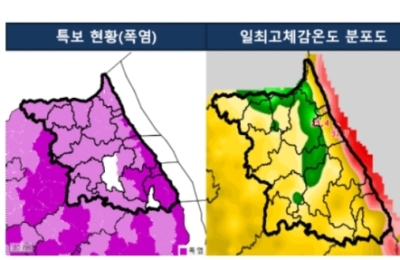KB 한투 키움 미래에셋대우 등 활발...대표주관 수수료보다 더 '짭짤'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3일 오후 2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이광수 기자] 증권사들의 비상장기업 투자가 최근 확대되고 있다. 기업공개(IPO) 시장내 증권사들간 주관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자 IPO부서의 전문성을 활용한 비상장기업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해 IPO업무를 담당하는 ECM(주식자본시장)본부에서 첫 비상장주 투자에 나선 데 이어 올해는 300억원 이상 비상장주에 투자할 계획이다. 키움증권도 IPO본부 차원에서 비상장 투자를 준비 중이다.
기존 플레이어들도 적극적인 행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IB부서에서 딜 소싱을 담당하는 1000억원 규모 프리(Pre)IPO펀드를 조성하고 비상장기업에 25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올해는 나머지 한도를 대부분 소진할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도 올해 ECM부서가 본부로 개편되며 금액제한 없이 우량 딜에 참가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증권사 IB에서도 직접 비상장주 투자가 가능해졌는데 최근엔 자기자본(PI) 투자와 별도로 IPO부서의 수익성 유지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래 증권사 IPO 부서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주로 한다. 이에 대표주관을 맡은 기업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어 우량기업 발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들은 투자기간을 최대 7년으로 가져가는 벤처캐피탈(VC)과 달리 2년 이내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같은 비상장주 투자라고 하더라도 VC와 증권사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VC는 아이디어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증권사는 수익성과 성장성 등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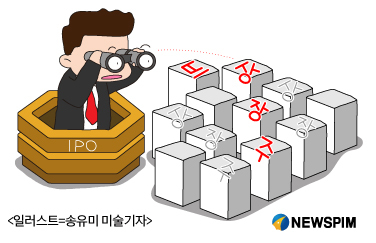 |
증권사내 코스닥 혹은 코스피 기업의 상장주관 수수료에 비해 비상장기업 투자가 차지하는 수수료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기존 상장사 IPO수수료는 증권사간 경쟁으로 코스피 대기업의 경우 상장주관수수료가 공모금액의 1%를 밑도는데다 코스닥 주관 수수료도 기술성 평가 혹은 해외기업이 아닌 이상 3% 이하로 결정되는 상황이다.
통상 대표주관계약부터 상장까지 1년~1년 반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관계약으로 '남는 게 없는' 장사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IPO (상장주관)수수료만 갖고는 유지가 어렵다"며 "지난 2015년의 경우 IPO부문 수수료와 프리IPO, 의무 인수분에서 발생하는 기타수익이 절반씩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주관계약을 맺을 때부터 비상장기업 투자를 염두에 두는 경우도 있다.
내년 목표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인 한 기업 대표는 "증권사와 상장을 위한 주관계약을 맺을 때 상장작업이 일정 이상 진행되면 5% 이하 규모로 (회사에) 투자하기로 이미 약속됐다"고 귀띔했다.
다만 경쟁 심화에 따른 리스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투자 역시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100억원 한도로 IPO본부 차원에서 비상장주 투자를 집행했지만 올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련 투자 한도를 없앴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지난해 IPO부 자체적으로 다수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검토했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 않았다. 신한금융투자 IPO실무 담당자는 "비상장주 투자 자체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이광수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