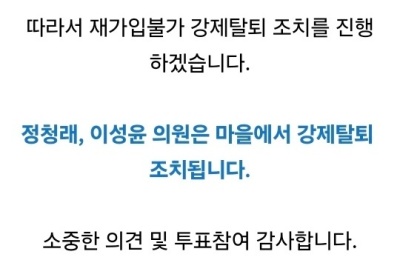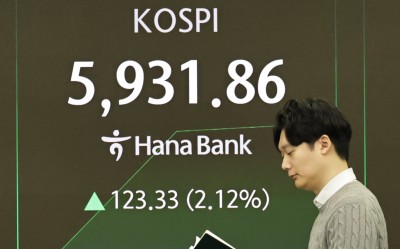2024년 7월 9일,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연구보안 프로그램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연구비를 수주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사이버 보안, 외국인 연구자 관리, 국제 공동연구 투명성, 민감기술 보호 등을 포함한 연구보안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인증받아야 한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국가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제도적 요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연구개발 경쟁력은 개방성과 협력에 기반해 왔지만, 최근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강화가 필요해졌는데 이러한 조치는 연구성과 유출 방지 차원을 넘어, 국가 연구 생태계의 신뢰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미국은 연구윤리 규범에서 더 나아가, 연구보안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새로운 과제로 인식하고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침은 NSPM-33(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33)과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라 연구 보안 정책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연방 정부로부터 연간 5천만 달러 이상 R&D 자금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FFRDC(연방 지원 연구개발 센터), 비영리 연구기관을 보호기관("covered institution")으로 간주한다.
이 기관은 ① 사이버 보안: NIST(미국 국립기술표준연구소) 기준에 따라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 ②해외 여행 보안: 국제 출장자 대상 정기 교육 및 여행 기록 관리 ③연구 보안 교육: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보안 교육 실시 ④수출 통제 교육: 수출 통제 기술을 다루는 연구자 대상 교육을 포함한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연방 기관은 기관들이 인증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기관에 대해 차별 금지, 유연성 보장, 행정 부담 최소화와 소규모 기관이나 자원이 부족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이 지침은 강조하면서 각 연방 연구 기관은 지침을 발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최대 18개월 내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국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연구와 혁신(Trusted Research and Innovation)' 지침을 운영하고, 유럽연합(EU)도 올해 '연구안보 권고'를 채택하였으며, 일본 또한 국제 공동연구 과정에서 외국 자금 수수나 이중 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OECD와 G7은 연구보안을 국제 협력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연구윤리, 연구비 집행 투명성, 연구부정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연구보안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해외 공동연구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 외국 인재 프로그램과의 충돌, 퇴직·이직 시 민감기술 반출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대응은 여전히 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보안 부재가 곧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직결된다.
이제는 우리도 연구보안을 국가 차원의 제도적 틀 속에 편입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해 ① 대형 연구비 수혜기관의 연구보안 프로그램 인증 의무화 ②공시·검증·파트너 실사·데이터 보안 등 표준 체크리스트 마련 ③정부 차원의 교육·문화 확산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 개인에게 떠넘겨진 부담을 제도적 장치로 흡수하고, 국가 연구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같이 의무와 함께 지원도 같이 병행하여야 한다.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연구보안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제도 정비를 미룬다면, 국제 공동연구에서 신뢰 부족으로 파트너십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연구윤리 다음 단계는 연구보안이다. 지금이 바로 국가 연구개발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