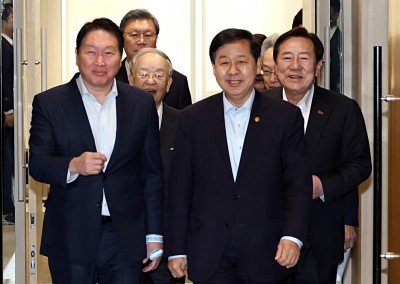"노점 있을 때 손님 더 많았는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절간에 있는 거 같아.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

설 대목을 앞둔 이달 8일 오후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영등포 시장)은 적막했다. 흐린 하늘만큼 상인들의 표정도 어두웠다. 두 손을 주머니에 푹 찔러 넣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시장 골목을 서성이는 앞치마를 맨 상인들이 장바구니를 든 손님보다 많았다. 영등포 시장 입구 20m 반경에 있는 상점 9곳 중 3곳 셔터가 내려져 있을 만치 문 닫은 가게도 여럿이었다.
영등포 시장에서 40년 넘게 장난감과 문구를 판매하고 있는 이모(83)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나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할머니는 "손님이 아예 없는 날도 있고 보통 한둘밖에 안 오는데, 많아야 6~7명이니 전기세는커녕 난방비도 못 건져"라며 "그래도 맨날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여는 건 혹시 기다릴 손님이 있을 수 있으니깐"이라고 말했다.
옆 점포의 송모(70) 할머니도 3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송 씨는 "오늘 딱 한 번 봤을 정도로 애들 보기 어려워. 애 대신 고양이나 강아지를 안고 오는 손님이 더 많아"라며 "예전에는 부모들이 애들이랑 구경 오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손주 줄 장난감을 고르는 '선물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엔 다들 핸드폰 열고 온라인을 '펑' 눌러 택배로 받지"라며 혀를 찼다
곳곳에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들어선 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시장 상인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참조기와 명태포 같은 수산물을 진열하던 70대 상인은 "오늘처럼 설을 앞둔 '맞대목'엔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손님이 많았는데 보다시피 여길 지나는 사람이 없어"라며 "말하기 싫을 만큼 힘들어서 다들 서로 얘기도 잘 안 해. 코로나19 때가 차라리 장사가 잘됐어"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영등포 시장 입구에서 12년째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노모는 빨간색 앞치마를 두르고 동그랑땡과 명태전 등을 부치고 있었다. 그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완전 절간에 있는 거 같아"라며 "사가는 전 양도 많이 줄었어"라고 하소연했다.
30년 이상 영등포 시장에서 모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85) 할머니 가게엔 '폐업 정리'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정 할머니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저걸 붙여놓고 가게를 내놨는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라며 "그때는 마스크 끼고도 왔는데 이젠 밖에 나오는 손님이 없어. 건너편 집은 어제 한 개 팔았데"라고 손을 내저었다.
이어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설 기간에 세일도 하고 예쁜 포장지를 끼워 파니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지"라고 덧붙였다.
땅콩집을 운영하는 70대 상인은 "'영등포 시장 이사 갔다'고 할 정도로 손님이 줄면서 하나둘 문을 닫았어. 이 골목엔 김밥집이 일곱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딱 1곳 남았고, 이 앞 남서울상가는 장난감이나 문구로 서울에서 제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상점이) 몇 곳 안 남았어"라며 고개를 떨궜다.
영등포 시장엔 좌판에서 고사리나 미역 등을 파는 노점이 한 곳도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매대 수 420여 대에 이르는 노점을 철거하면서다.
한 영등포 시장 상인은 "노점이 없어지고 '콩나물 살 때도 없다', '추억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하는 손님이 많아"라며 "오히려 노점들이 있을 때 오가는 손님이 더 많을 정도로 시장 상인들과 잘 어우러졌는데, 낡고 오래됐다며 현대화했던 게 정감 있던 풍경을 망쳤어"라고 지적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