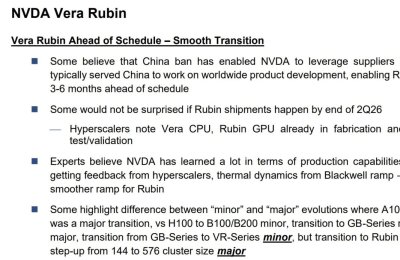안정적 주행감과 고급스런 디자인은 E63이 앞서
[뉴스핌=전민준 기자] 지극히 독일적 색채가 강한 머슬카 두 대를 만났다. BMW M5(이하 M5)와 벤츠의 메르세데스 E63 AMG(이하 E63). 박진감 넘치는 4.0리터 터보엔진이 들려주는 중저음의 배기음과 다부진 차체로 국내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힌다.
M5는 파괴력 넘치는 V8 트윈터보 엔진을 얹고 진입장벽을 낮춘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E63은 가격이 M5보다 비싸지만 경쟁력 있는 주행 성능으로 벤츠의 명성을 자랑한다.
기자는 M5와 숙명의 라이벌 E63 중 누가 최고의 머슬카인지 지난 12월 초 비교해봤다.
◆ 다부진 근육질 M5 vs 늘씬한 야생마 E63
다부지지만 품위 있는 몸매. 구릿빛의 근육질 몸매를 연상시키는 느낌. BMW M5다. 잘 빚어진 외관은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고 세련미가 넘쳐났다.
기본형 5시리즈보다 앞뒤를 각각 7㎜ 이상 낮췄고 20인치 크기의 휠은 M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강인함을 준다. 외관과 달리 감성적인 실내는 단순함 속에 혁신이 묻어 있다. M5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실내 공간에는 차량 생산번호를 기입한 명판을 더했다.
반면 E63의 외관은 볼륨감이 넘친다. 늘씬한 야생마 같다고나 할까. 고성능 모델인 것을 뽐내듯 굴곡진 선을 강조한 차체 라인을 적용했다.
실내 운전석과 조수석 정면에 있는 부분(대시보드) 가운데 있는 화면은 하얀색을 적용해 빠르고 날렵(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했다. 운전대와 등받이가 몸을 감싸주는 형태의 의자(버킷시트)에는 붉은색을 적용해 고성능 모델 이미지를 부여했다.

◆ 박진감 넘치는 코너링 M5 vs 안정적인 E63
가을 기운이 완연한 평일 자유로에 M5와 E63을 올렸다. 기자는 시승을 진행한 날 동료 기자를 불러내어 차를 번갈아 타기로 했다.
기자가 먼저 탄 차는 M5. 최신 모델인 데다 M 트윈파워 터보기술을 적용한 고출력 V8 엔진을 장착, 최고출력 575마력(6000~7000 rpm.), 최대토크 69.4kg∙m(1500~6000 rpm)을 발휘한다는 이 모델에 발걸음이 자연스레 갔다.
헤이리마을에서 벗어나 곧바로 자유로에 진입,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4.2초밖에 걸리지 않는 즉각적인 엔진 동력을 느끼면서 고속 구간을 지나 코너 구간에 진입했다. 코너 구간에 진입하자마자 두 라이벌의 본격적인 코너링이 시작됐다.
고출력 V8 엔진은 박진감 넘치게 위험수위까지 치솟았고 7단 M 더블클러치 변속기는 빠르고 정확하게 동력을 전달했다.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들끓기 시작했다.
그 순간 시승에 함께 참가한 다른 기자가 탄 E63이 기자가 탄 M5 앞을 지나간다. 서로 코너 안쪽으로 조금씩 말려들었고 계기판의 차체자세제어장치(ESP작동등)가 깜박거렸다.
두 대의 독일 고성능 차는 중간기착지를 향해 차선을 들어왔다 나갔다. 간발의 차이로 먼저 도착한 E63과 격렬한 추격을 펼친 M5가 그 옆에 나란히 주차했다.
이번엔 E63이다. 시동버튼을 누르자 V8 터보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음이 적막을 깨면서 달릴 채비를 한다. E63의 코너링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낮은 무게중심과 높은 성능을 지닌 마찰장치(그립)의 타이어가 극강의 접지력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 강력한 퍼포먼스 M5 vs 가볍고 날카로운 E63
다시 M5에 몸을 실었다. 탄력적이었다. 기민하게 움직이고 노면에 딱 달라붙어 달리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은 처음이다.
가속페달을 밟자 곧바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강력한 힘이 몰아친다. 제로백 4.2초의 위용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엔진은 머뭇거림이 없고, 회전 상승이 가볍고 빠르다. 낮은 회전수에서도 토크감이 굉장해 오른발에 가볍게 힘 주는 것만으로도 유유히 주변의 흐름을 이끌었다.
이번엔 E63에 몸을 실었다. 짜릿한 가속 성능에 온몸의 털이 쭈뼛 곤두섰다. 오른발 끝에 힘 줄 때마다 기계제품의 치수(게이지)가 경고 수치를 향해 빠르게 솟구치고, 변속되는 마디마다 걷잡을 수 없는 희열이 밀려왔다. 운전대는 생동감 넘치지는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빠르며 날카로웠다. 끝없는 앞바퀴 접지력 덕분에 점점 자신감이 붙었다.
과거 고성능 차는 운전자의 높은 기량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존재였다. 그러나 두 차는 누구나 힘 들이지 않고 빠르게 몰 수 있다. 평소에는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모델이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