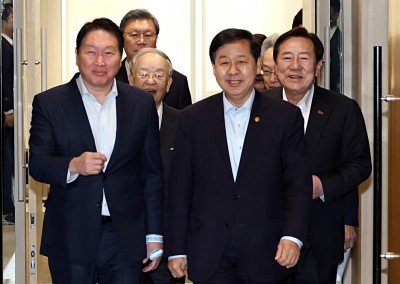"일본차 영업이익률 10%넘어...엔고에 버틴다"
[뉴스핌 = 김지완 기자] ‘엔화 강세면 한국 자동차 기업이 반사이익을 받는다'는 명제가 깨졌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엔화 가치에 관계없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데다 일본 내 생산비중도 낮췄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엔화 강세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현대차 주가는 16만3500원에서 13만9000원으로 하락했다. 이 기간 달러/엔 환율은 123.36엔에서 105.53엔으로 떨어졌지만 영향을 안받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엔화 강세일 때 한국 자동차기업이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명제는 더이상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우선 일본차와 한국차의 수요층이 완전히 다르다는 분석이다. 최원경 키움증권 연구원은 “‘도요타 캠리 살래? 현대자동차 쏘나타 살래?’ 등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캠리의 주수요층은 백인·중산층·노인층인 반면 쏘나타는 흑인·히스패닉 계열”이라며 “현대차의 브랜드 지위가 올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일본차뿐만 아니라 미국 빅3와 유럽차와도 중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에 따라 현지 차량가격을 조정하던 마케팅 전략도 사라졌다. 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약세가 지속됐지만 차량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반대로 엔화강세가 된다고 해서 차량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최근엔 환율에 따른 이익을 R&D에 투자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엔화강세에 따라 현지 딜러 인센티브를 바꾸는 것도 없어졌다. 최원경 연구원은 “현재 미국내 인센티브는 기아차>일본차>현대차 순서으로 많다"며 "환율 변동에 따른 인센티브 변화는 지난 몇 년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과거와 비교 일본과 한국 차의 경합 강도가 약해진 것도 원인이다. 도요타·혼다·닛산 등 일본자동차업체들은 대형SUV· 픽업트럭·라이트픽업 등을 생산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던 세단시장에서 벗어났다.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SUV시장이 확산일로에 있다는 점도 엔고와 국내 자동차업계 반사이익 상관관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시장은 SUV(픽업, 라이트픽업 포함) 57%, 세단 43%였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논리적으로 엔화강세로 우리가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는 미국에서 차량믹스의 문제로 당장 현대·기아차의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거나 엔화대비 원화약세가 되면서 차가 많이 팔리기엔 어려운 환경이다”고 정리했다.
고 연구원은 “혼다·닛산은 미국·멕시코 등의 생산비중이 높아 엔화변화에 문제가 없다”면서 “일본 생산비중이 높은 도요타·마쓰다·스즈키·미쓰비시도 과거 엔고시절 영업이익률 1~2%에서 현재 10%수준까지 높아져 엔고를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미래에셋TIGER자동차상장지수’와 ‘삼성KODEX자동차상장지수’의 3개월 수익률은 각각 8.45%, 8,76%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일본중앙은행(BOJ) 통화정책이후 달러/엔 환율이 급락이 시작된 일주일간 이들 펀드의 수익률은 각각 -1.0%, -1.26%로 떨어졌다. 자동차 관련 펀드로 자금유입도 거의 없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주 실적에 엔화강세보다 더 큰 영향을 보는 영향을 주는 변수로 ▲신흥국 통화가치 ▲유로/원 환율을 꼽았다.
 |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