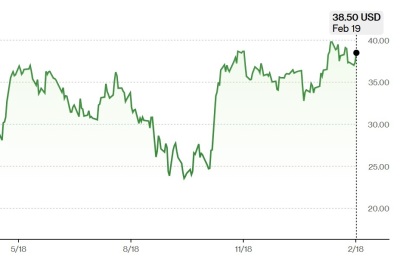공급부족으로 향후 부작용 초래..악수(惡手)될수도
 |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이른바 ‘패닉(공황)’에 빠졌다.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로 갑자기 수억원대 준조세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부터 준공까지 차액이 10억원 발생해 이 중 4억~5억원을 환수금으로 토해내는 게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 한 채 가진 조합원에겐 상당한 부담이다. 땅이나 주택이 공공재 성격을 지녔다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초과이익환수액 규모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다. 정부가 정해진 기준을 갖고 분담금을 책정한 거라지만 이해 관계자 입장에선 세금 폭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가구당 최대 8억원까지 부담하는 사업장에 나올 전망이어서 불안감은 더하다. 정부가 공포감을 조성해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의지마저 느껴진다.
이처럼 초강도 규제가 적용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마지막 카드'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이름만 존재하던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켜 시장에 상당한 충격파를 안기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출범 한 달여 만에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후속 대책을 포함해 부동산 대책을 8번 쏟아냈다. 이들 대책은 집값 안정화와 서민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집 투자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언론 플레이'를 병행하며 집값 안정화에 주력했다.
하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강남 재건축 단지는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자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쳤다.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노른자위 단지가 대거 재건축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데다 저금리에 갈길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해 2012년까지 시행됐다. 작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적용을 받은 단지 5곳으로 소규모 연립주택이 전부다. 이마저도 2곳은 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 중이다. 부담금도 가구당 33만원부터 최고 554만원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노무현 정권은 그해 서울 아파트값이 6% 넘게 오르자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가 주요 대책이다. 1년 남짓 효과를 보는 듯했다. 2004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률이 1%대에 그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을 옥죄는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15년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6%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듬해에는 20%를 웃돌았다. 글로벌 경기가 좋았던 이유도 있지만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부작용을 낳은 탓이다.
공포로 시장을 이기긴 어렵다. 정부가 노리는 것이 시장에 공포감을 줘 투기수요를 위축시키고 집값 상승을 꺾는 것이라면 단기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법은 될 수 없다. 왜곡된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큰 부작용을 낳는다. 그동안 ‘겁주기식’ 정책으로 집값을 잡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1970년대부터 이어진 강남의 빛나는 영광이 언제까지 이어질진 모르겠다. 하지만 강남을 대체할, 어쩌면 비슷한 수준의 지역을 발굴, 개발하지 않고서는 강남 집중화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하지 않다. 사람이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많이 지어줘야 한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안정화하는 것은 자연스런 시장 논리다. 강남을 옥죄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해답이 아닌 듯하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