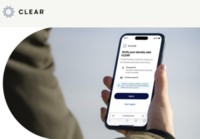아직도 추석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대추 밤을 돈 사야 추석을 차렸다
이십 리를 걸어 열하루 장을 보러 떠나는 새벽
막내딸 이쁜이는 대추를 안준다고 울었다
절편 같은 반달이 싸리문 위에 돋고
건너편 성황당 사시나무 그림자가 무시무시한 저녁
나귀방울이 지껄이는 소리가 고개를 넘어 가차워지면
이쁜이 보다 삽살개가 먼저 마중을 나갔다.
- 노천명 '장날'('여성'지, 1939)

요즘에는 몇 걸음만 걸어나가면 추석상을 차릴 수 있는 과일과 떡, 어포 등을 살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예전에는 장날에 맞춰 십 리 길이 훨씬 넘는 길을 걸어나가야 장을 볼 수 있었다. 할머니나 어머니가 장에 가는 날이면 괜스레 마음이 설렜다. 함께 따라나서면 좋으련만, 야속하게도 이런저런 이유로 따라나서기 쉽지 않았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집에서 힘들여 키운 닭이나 달걀을 짊어지고 장터로 갔다. 아니면 뒤뜰에 열린 대추나 밤, 감을 따서 장터로 향했다. 물물교환이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늘 궁금했던 건 추석 전야, 장에서 돌아오는 어머니나 할머니의 장보따리였다. 거기에는 필시 추석빔으로 불리는 옷 한 벌 정도는 들어 있었다. 일 년에 딱 한 번의 기회다. 장보따리 주변에 둘러앉아 눈을 반짝이던 아이들의 시간은 너무도 길고길었다.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로 시작하는 동요는 이제 먼 옛날의 화석(化石)이 되었다. 푸근했던 시골 장터의 시끌벅적함도 사라지고, 마음 졸이며 새 옷을 기다리는 동심도 사라진 지 오래다. 그래도 추석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명절이다. 올해 추석은 좀 더 정이 넘치고, 행복한 추석이었으면 좋겠다. oks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