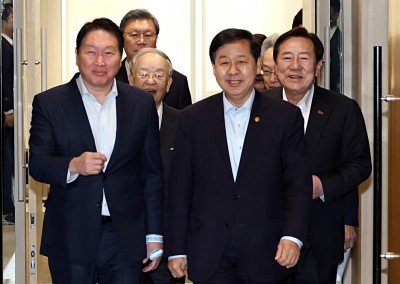[편집자 주] '치사율 100%'로 중국에서 악명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 상륙하면서 우리나라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돼지과(科) 외에 다른 동물에는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종합 민영통신 <뉴스핌>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실체와 오해하기 쉬운 내용, 대응책 등을 정리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전염성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무서운 질병이다.
따라서 ASF가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
◆ 전염성·치사율 높아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주변국의 발생현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ASF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돼지나 멧돼지 등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만 감염되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기 때문이다.

ASF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야생멧돼지가 자연숙주다.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돼지인 혹멧돼지(warthog)와 숲돼지(giant forest hog)는 감염돼도 임상증상이 없어 ASF 바이러스의 보균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돼지 외에는 물렁진드기(soft tick)가 이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가 돼지나 야생멧돼지를 물어서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치사율이 높지만, 돼지과 외에 다른 동물이나 사람은 전염되지 않는다"면서 "지나치게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 감염되면 피부에 붉은 반점과 출혈 생겨
ASF에 전염된 돼지는 어떤 증상을 보일까. 바이러스가 종류가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목이나 복부 등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코나 귀, 다리에 출혈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사진 참고).
모든 연령의 돼지가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된 돼지가 빠르면 며칠 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다만 치사율이 높긴 하지만 구제역보다 전염성이 크지는 않다. 같은 축사 안에서는 전체 무리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지만, 차단방역이 잘 이뤄진다면 다른 축사로 전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다.
특히 어떤 국가나 지역에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 보통 짧은 열성질환이 나타난 이후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게 큰 특징이다. 그러나 발생 초기에 세밀하게 점검하지 않을 경우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일반적인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이나 고병원성 돼지생식기소화기증후군(HP-PRRS), 폐혈증성 살모넬라증(Septicaemic salmonellosis) 등 다른 출혈성 돼지질병과 쉽게 혼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혈청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면서 "정기적인 소독과 함께 지속적인 예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