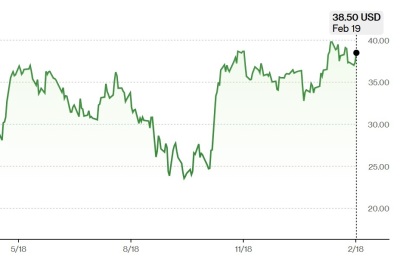[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17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47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일명 다보스포럼)에서 이슈 키워드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이 제시됐다. 공교롭게도 1년 전인 제46회 다보스포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이해'가 주제였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이에 따른 삶의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이슈인 셈이다. 금융권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 이른바 ICT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가 대세로 떠오른 지 오래다. 국내 4대 금융지주도 올해 너나할 것 없이 신년사 키워드로 '디지털 강화'를 제시했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년사에서 "초연결과 융복합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핀테크 시대와 마주하고 있는 금융권의 '현실'은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얼마 전 만난 한 금융당국자의 고백(?)은 이목을 끈다.
국제금융회의에 다녀온 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금융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권과 당국의 자세에 아쉬움을 표했다.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컴퓨팅'은 핀테크의 핵심 중 핵심인데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대응이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발빠르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일례로 이미 해외에선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금융통합서버(외국 금융사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전세계 통합해 한군데만 두는 것)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 중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하나도 없다.
최근 확산 추세인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개인 간 대출(P2P)의 경우도 마찬가지.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의 '딜레마'란 전제를 달았지만, 금융당국의 P2P에 대한 규제(가이드라인)가 다소 보수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트렌드. 글로벌 P2P 시장의 변화와는 상당 부분 갭(Gap)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고위관계자는 "미국, 유럽, 중국에선 P2P시장의 변화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기존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 열거식)에서 해외의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 업무는 모두 허용)처럼 법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세미나(한국금융연구원 주최)에서 소개된 '실리콘밸리은행'의 새로운 성공모델 사례는 4차 산업혁명 길목에 선 국내은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개된 실리콘밸리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분 투자다. 7000여개 핀테크 업체를 분석하고 추적하면서 대출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업체의 주식을 사고 인수하는 식이다. 이는 전통적인 상업은행,투자은행과 차별화한 실리콘밸리식 '현장 밀착형' 금융으로 불린다.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이 주요 비즈니스모델이지만 자기자본이익율(ROE)은 15%에 달한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은행은 핀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험과 비용을 굉장히 낮게 유지,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내은행의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은행의 출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4차 산업혁명, 핀테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내은행들도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금융권이 연초만 되면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결국 기존 사업모델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달 김도진 신임 기업은행장이 취임했다. 또 조만간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은행장, 우리은행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은행권은 새 CEO체제에 따른 변화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금융트렌드의 대변혁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작됐다. 새 CEO들이 현장에서 글로벌 트렌드에 이목을 집중해야 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