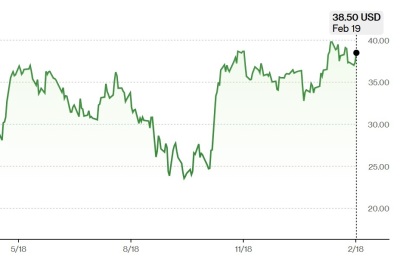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스토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기대 수명은 늘어가는데 나이 드는 것은 달갑지 않다.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쓸쓸하게 노년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노후 자금이라도 착실히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내 고갈될 거라는 기사가 수시로 뜨고, 갖가지 연금 상품과 재테크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라고 유혹한다.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은 마당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정말 돈을 모으는 것만이 잘 나이 들기 위한 유일한 대책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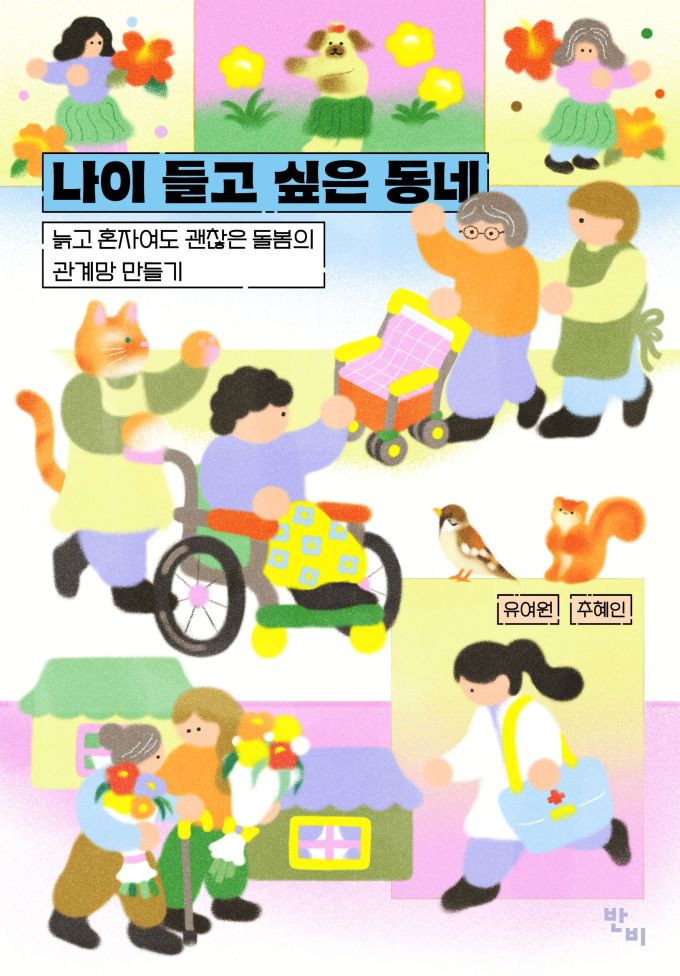
여기 나답게 나이 들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타인과 관계 맺고 서로를 잘 돌보며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한다.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말이다. 나이 듦과 취약함, 혼자됨을 긍정하며 살아가기 위한 대안이 담긴 책 '나이 들고 싶은 동네'(반비)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안심하고 나이 들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살림') 사람들의 이야기다.
살림은 비혼 여성주의자인 두 저자의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부모를 비롯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당장 몸이 아플 때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텅 빈 돌봄의 자리를 목도한" 두 사람은 새로운 돌봄의 관계와 문법을 모색한다. 그렇게 여성주의 활동가 유여원과 여성주의 의료를 꿈꿔온 의사 추혜인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여성주의 의료협동조합' 살림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한다.
2012년 창립한 살림은 어느새 조합원 수가 5,000명을 넘기며 서울시 은평구에 자리 잡았다.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세운 의료기관(살림의원, 살림치과, 살림한의원)을 운영하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 조합원들은 함께 여성주의를 공부하기도 하고, 돌봄장과 유언장을 쓰며 내가 바라는 돌봄과 죽음의 상을 그려본다. 등산, 풋볼, 달리기, 뜨개질 등 다양한 소모임을 꾸린다.
살림의 의료기관은 의사와 환자의 권력관계가 평등하다는 점에서, 또 환자에게 맞춤형 독특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비의료인 조합원이 실습 온 예비 의료인에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교육을 하고, 비의료인임에도 약의 도입 여부를 함께 판단하면서 의료의 수혜자와 공급자를 나누지 않는 민주적 진료를 모색한다. 거동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직접 의료진이 찾아가고, 한글을 못 읽는 당뇨 환자에게 한글 교육을 권장해 스스로 처방된 식단표를 읽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돕는 것도 한 사례다.
이 책은 의료를 넘어, 혼자여도 함께 돌보며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길,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살림의 특별한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한 예로, 노인 일자리 사업 '건강 이웃' 참여자들은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직접 마을에서 찾아내고 방문해 함께 운동하며, 이웃을 돕는 사례를 공유해 나간다. 살림 FC의 차별 없는 축구 모임, 이웃의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공연하는 훌라 댄스 모임, 여성주의 수업 등이 살림 내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웃이 서로 안부를 묻게 한다.
"끝까지 나답게 살다가 아는 얼굴들 사이에서 죽고 싶다." 지금도 조합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 말은 이제는 살림다운 돌봄의 대표 슬로건이 되었다. 두 저자는 '나다움은 뭐지? 나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라는 물음에 두 가지로 답한다. 하나는 '죽음과 돌봄에 있어서의 자기 결정권'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지의 다양성'이었다. 살림을 운영하는 두 저자는 의료기관을 넘어 '이웃이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고, '안심하고 나이 드는 안전망'을 수립하는 과정을 조합원들의 이야기로 따뜻하고 재치 있게 풀어나간다. oks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