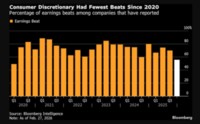[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큐(Cue:)'를 선보였다. 구글의 '바드(Bard)'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Bing Chat)처럼 키워드를 넣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까지 검색하지 않아도 일목요연하게 AI가 정보를 전달해 주니 편리해서 좋다.
대화 생성 AI '클로바(Clova) X'와 함께 사용해 보니 조만간 오픈AI의 대화 생성 AI '챗GPT'의 월 구독료인 20달러를 아낄 수 있겠다는 기대도 생긴다. 당장 챗GPT의 구독을 해제할 수 있을 만큼 유용하다면 더 좋았겠지만, 클로바 X와 함께 무료로 이만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게 된다.
 |
개인적인 용도에 맞게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활용하다 보니 향후 5년 안에는 AI가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생성 AI는 생산성 향상보다 호기심이 더 크게 작용했던 기존의 AI 비서와는 차원이 완전 다르다. 조금 오버하면, 지식노동자로서의 나의 은퇴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까지 들게 만든다.
최근 5년 사이 어떤 기술이 나의 삶에 이처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적은 없었다. 10년 전 즈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SNS가 '집단지성'을 통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생성 AI는 너무나 다르다. '상상'이나 '기대'가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로 함께 일하고 있고, 결과물 또한 상당히 괜찮다. 이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위기감'보다 AI가 나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더 커진다.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네이버가 소위 'CP(콘텐츠 제공사)'를 통해 언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성 AI를 통해 직접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까지 한다면 얼마나 파장이 클지 아찔하기까지 하다. AI보다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한다면, 생존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는 일부 기자와 언론사에 국한된 얘기 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 서비스의 확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결코,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기계를 이길 수 없다. 기계는 지치지 않는다.
그리고 AI는 영역 구분이 없다. 지금 이 순간도 고도화되고 있는 AI는 언젠간 사람을 초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사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할 판단과 합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유용한 서비스가 새로 나왔다고 바라보기만 할 때가 아니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