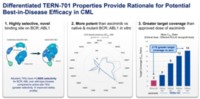[뉴스핌=강필성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자·손녀가 세배를 올리면 덕담과 함께 빳빳한 신권을 새뱃돈으로 건네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설 풍경이다. 시중은행이 이 풍경을 바꾸려고 한다. 모바일 뱅킹 시대를 맞아 모바일로 세뱃돈을 줄 수 있는 서비스(어플리케이션)를 내놨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있으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세뱃돈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빳빳한 세뱃돈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낯설기만 하다. 과연 이 모바일 세뱃돈이 대세가 될 수 있을까.
 |
| 신한은행 써니뱅크의 '모바일 외화 복주머니' 이벤트 페이지. |
27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설을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 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이는 중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외화를 선물하고 또 선물 받은 외화를 보관할 수 있는 ‘써니뱅크 모바일 외화 福주머니’ 서비스를 출시했다. 스마트폰 앱 써니뱅크만 있으면 간단하게 외화를 송금할 수 있다. 최근 세뱃돈을 용돈이 아니라 유학 등을 고려한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특히 모바일에 친숙하지 않는 중장년 고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절차 등 복잡한 절차를 없앤 것이 특징. 환전 시 주요통화(USD, EUR, JPY)는 90%까지 환전우대율을 적용했다.
KEB하나은행은 ‘세뱃돈 보내면 세배(X3) 드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하나톡에서 세뱃돈을 송금하면 ‘세뱃돈 행운’이 자동으로 발송되고 즉석 추첨을 통해 최대 3배의 세뱃돈을 제공하는 것. 최대로 제공되는 규모는 3만원(3만머니) 정도지만 받는 입장에서 당첨의 재미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들이 모바일 세뱃돈 이벤트를 본격화 한 것은 현금이 오가는 전통 명절에서 모바일 수요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자사 모바일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렇다고 이 세뱃돈 이벤트가 단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에서는 이 모바일 세뱃돈이 언젠가는 보편적인 수단이 될 가능성을 예의주시 중이다.
◆ 중국 세뱃돈 '홍바오', 80억8000만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사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세뱃돈에 해당되는 ‘홍바오(包)’의 디지털 비중이 무섭게 커지고 있다. 중국의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텅쉰(騰訊)의 웨이신(微信)은 지난해 춘절 오간 디지털 홍바오가 80억8000만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8배 성장한 수치다.
중국에서는 ‘홍바오 경제’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금융권의 홍바오 전송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모바일 세뱃돈이 언제쯤 지폐를 대체할지는 미지수다. 홍바오 마케팅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된 중국과 달리 국내의 반응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전통적 설 명절의 세뱃돈을 모바일 송금으로 대체하기까지 넘어야 할 변수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단적으로 우리은행은 지난해 설에 모바일앱 위비톡으로 세뱃돈을 보내면 커피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의 쿠폰을 추첨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올해 설에는 세뱃돈 관련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시 경조사 송금 서비스를 선보이며 진행한 프로모션이었을 뿐이라며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모바일 세뱃돈 이벤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에서 지급결제 서비스로서 홍바오가 유행하게 된 것은 마케팅적 효과와 SNS와 연동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며 “반면 한국은 중국과 달리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 돼 있어서 중국의 모델이 단기간 내 대입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에서 지급결제 서비스가 대체제가 되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카드결제의 비중이 높다.
지 연구위원은 “중국의 ‘디지털 홍바오’ 같은 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융합되는 등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