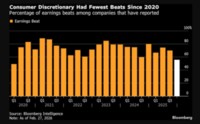[뉴스핌=이강혁 기자] 지난해 12월초.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 관계자들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마주 앉았다.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였지만, 양쪽의 표정은 어느때보다 무거웠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의 대중국 사업 관련한 우려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에게서 돌아온 답은 이러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기업 관계자들은 마지막 보루로 우리 정부를 찾았지만, 각자도생(各自圖生) 고민을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12월 말. 중국 정부(공업정보화부)는 전기차 모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핵심인 '신에너지 자동차 추천 목록'을 발표했다. 한국의 삼성SDI, LG화학이 생산한 배터리 장착차량은 단 한 개 모델도 포함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게 중국 시장에서 영업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없다.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메이커와 로컬 전기차의 각축장인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할 업체는 없다.
수천억원을 들여 중국 현지공장(2015년)을 설립한 한국 배터리 대표주자들이 중국 정부의 펀치에 넉다운된 순간이다.
재계에 따르면 대중국 사업을 하는 많은 우리 기업들은 정유년(丁酉年) 새해 벽두부터 중국의 거세지는 경제보복 의구심으로 근심걱정을 키우고 있다. 이해가 얽혀있는 기업들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나, 속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대의 경영리스크로 중국이 부상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복차원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정황은 곳곳에서 뚜렷하게 엿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내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지며 한류산업 전반에 숨통을 죄고 있다. 롯데그룹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국내 사업장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면세업계도 한바탕 난리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한국행 전세기 항공편 운항이 불허된 탓이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지정학적,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느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어지러운 시국을 감안해도 '기업은 뛰는데 정부는 걷고 있다'는 이야기가 재계 일각에서 나온다. 잔뜩 움츠려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기업들 입장에선 나서서 푸념하기 어렵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그동안 팔짱낀 시간이 너무 길었다.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 동안 기업들은 이미 원투펀치를 여러차례 얻어 맞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문제는 단적인 사례. "답이 없다"며 해법찾기를 기업의 몫으로 놔두는 사이 15억명의 매력적인 소비시장은 그만큼 멀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말고도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지 않느냐"며 애써 위안을 삼는 분위기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내 사업이 흔들리면 작은 파동은 한국경제에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으로 자라날 수 있다. 전세계가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고는 요즘,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위기탈출을 중국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한 재계 인사는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대륙(중국)을 상대로 개별기업이 해법을 찾는다는 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정당하게 의구심을 해소하면서 관시(중국 정부) 스킨십을 정상화할 채널가동이 늦어지면 올해 농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