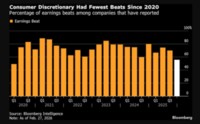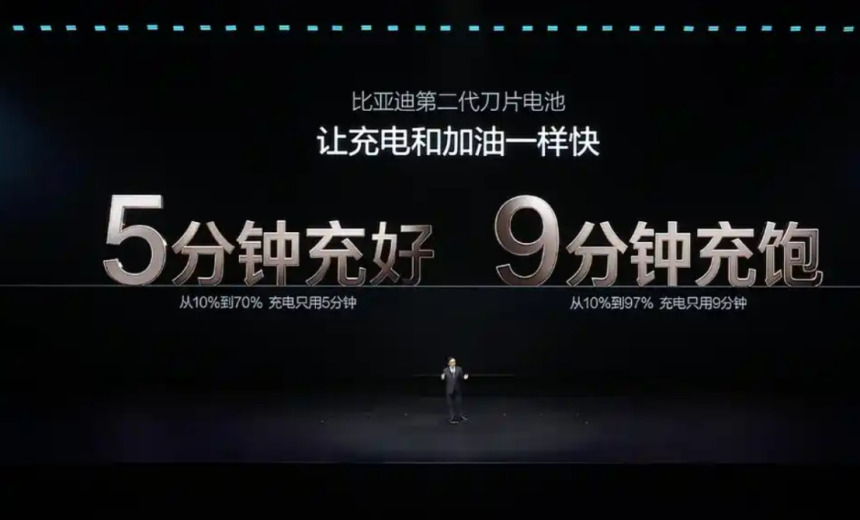TV에서 모바일, 라이브에서 VOD…다양한 플랫폼 개발 과제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는 한국 스포츠 방송 역사에서 전례 없는 실험이다. JTBC는 지상파 3사를 제치고 2026~2032년 올림픽 중계권을 단독 확보했다. 2028 로스앤젤레스 하계, 2030 프랑스 알프스 동계, 2032 브리즈번 하계 대회까지 이어지는 장기 패키지다.
JTBC는 나아가 2026 북중미 월드컵, 2030 100주년 월드컵까지 쓸어 담으며 총 5000억~70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올림픽 중계권은 3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올림픽과 월드컵의 국내 중계 권한을 JTBC 한 곳이 독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승자의 자리에서 맞이한 첫 무대는 쉽지 않다. 개회식 생중계 시청률은 전국 기준 1.8%에 불과했다. 2024 파리 올림픽 당시 KBS·MBC·SBS 합산 시청률 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10일(한국시간) 쇼트트랙 혼성 계주 준결선·결선은 평균 11.7%, 최고 13.8%까지 올랐지만, 전반적인 시청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다. 과거 올림픽의 '기본 20%' 공식은 파리 올림픽 때 이미 깨졌다. 이제 질문은 명확하다. 예전 시청률을 전제로 짠 중계권 모델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점이다.
독점 중계 구조는 편성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13일 한국 설상 첫 올림픽 금메달, 그것도 부상 투혼과 역전 드라마로 완성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이 JTBC 메인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되지 않았다. 같은 시간대 쇼트트랙 중계가 우선 편성되면서, 최가온의 금빛 점프는 딜레이 중계와 VOD 클립으로만 소비됐다. 예전처럼 지상파 분산 중계였다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치명적 실수였다.
이 문제를 단순히 편성 책임자의 실수로만 돌리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앉아 두세 시간씩 광고를 견디며 경기를 보지 않는다. 현대인들의 시청 방식은 하이라이트, 결정적 장면, 30초~3분짜리 클립 중심으로 이동했다. 브라운관에서 모바일로, 라이브에서 VOD로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방송사들은 올림픽 기간에도 광고 수익과 편성 효율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하는 반면 유튜브·OTT·포털의 스포츠 클립 트래픽은 대회마다 최고치를 경신한다. 올림픽의 감동은 여전하지만, 그 감동이 소비되는 메인 무대는 TV가 아닌 모바일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JTBC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과거 공식을 붙잡고 있는 느낌이다. 종편 채널 특성상 예능·드라마·뉴스 편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광고 단가와 편성 분량도 지상파만큼 확보하기 어렵다. 여기에 젊은층 이탈까지 더해지며, 중계권료와 제작비를 TV 광고만으로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JTBC의 계약은 2032년까지 장기 약정으로 묶여 있어 되돌리기 어렵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딜을 뒤집는 것도 쉽지 않다. 승자의 저주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해법은 명확하다. JTBC가 독점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허브'로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상파 3사에 중계권 재판매만 매달렸지만, 이제 OTT·케이블 스포츠채널·포털·빅테크 플랫폼 등으로 서브 라이선스와 동시 송출 구조를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

라이브 중심 사고를 버리고 디지털 유통을 동등한 축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최가온의 금메달 생중계를 놓쳤다면, 최소한 디지털에서는 가장 빠르고 잘 편집된 클립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 독점권자의 권리이자 책무다. 현재는 유튜브·해외·팬 계정이 먼저 퍼뜨리고, JTBC는 뒤쫓는 모양새다.
올림픽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다. 우리 세대가 무엇을 보고 공유했는지를 기억하는 거대한 장이다. 독점의 성과는 '얼마에 권리를 사서 얼마를 남겼는가'가 아니라, 올림픽의 감동을 얼마나 넓고 효과적으로 나눴는가로 평가받는다.
JTBC의 올림픽 독점은 현재까지는 승자의 저주에 가깝다. 하지만 2032년 브리즈번 대회가 끝난 뒤 이 실험이 스포츠 중계 모델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록될지, 한 방송사의 과도한 욕심으로 남을지는 앞으로 6년 간 JTBC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zangpab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