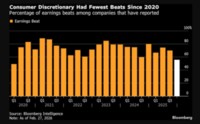[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내년 총선에서 '아무도 안 뽑겠다'는 지인이 절반이다. 벌써 총선을 언급할 정도인 이들은 절대 정치 무관심론자가 아니다. 정치에 좀 관심 있다는 국민이 요즘 정치를 더 경악스러워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갸우뚱했다가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내년 총선 9개월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벌써 누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노리고 있는지, 공천은 어떻게 할 건지를 두고 떠들썩하다. 현역이나 원외 인사는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들으며 상대의 동향을 파악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

이런 와중에 국민은 '아무도 안 뽑겠다' 선언한다. 누가 출마하는지는 국민의 궁금사항이 아니다. 그냥 누가 나와도 싫은 게 현실이다. 국회 안과 밖에서 느끼는 온도 차가 너무 크다.
국회 출입 기자로 1년 반 정도 생활하며 가장 많이 쓴 기사가 바로 정치 혐오를 대변한다. '네 탓 공방' 이 네 글자는 언제나처럼 따라다니는 정치권의 헤드라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를 달궜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도 네 탓 공방의 연속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은 조건부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결론이 나기 전에도 후에도 네 탓 공방은 식을 줄 몰랐다.
현재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로 다투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적합하니 마니, 이것이 문제로다. 모든 문제에서 여야는 이렇듯 대척점에 있다. 마음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 국민도 화합과 통합의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어둘 수밖에.
선출직은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얻고 당선돼야 의미가 있다. 다수의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은 채로 혹은 대체 개념으로 뽑힌 것이라면 무슨 당당함으로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을까. 권력자의 동력은 국민 지지다. 쉽게 오르내리는 '정치 혐오'라는 단어에 익숙해지지 않는 여야이길 바란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