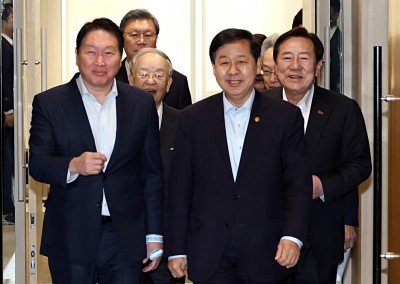정부-조선3사 협력..."시장 안착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조선사들이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수주를 휩쓸고 있지만 국내에서 개발한 LNG선 화물창(보관탱크)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사들이 정부와 협업하거나 개별적으로 화물창 기술개발에 성공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선사들이 발주 시 기존에 사용하던 화물창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선호해 좀처럼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조선 3사(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가 올해 수주한 69척(한국조선해양 32척·삼성중공업 22척·대우조선해양 15척)의 LNG선 전부는 프랑스의 엔지니어링업체 GTT(Gaztransport&Technigaz)의 기술인 멤브레인 타입을 적용하고 있다. 멤브레인은 사각형태의 화물창이 선체와 하나된 형태로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적재량이 많다.
멤브레인형 화물창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조선사들은 선가의 5% 가량을 로열티로 GTT에 지불하고 있다. 영국의 해운조선 시황조사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LNG운반선의 신조선가는 2억500만 달러(2435억원)다. LNG선 하나당 120억원 가량을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 3사가 69척을 수주했기 때문에 8000억원 이상 로열티로 지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멤브레인형 화물창이 글로벌 표준이 되자 국내 조선사들도 독자기술을 개발에 나섰고 실제 성공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 및 조선 3사가 지난 2014년 KC-1이라는 한국형 화물창 기술을 개발했지만 안전성 문제로 선사들의 관심을 얻지 못했고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이 하이멕스, 대우조선해양이 솔리더스라는 독자 화물창 기술을 개발해 영국 로이드선급 인증을 받았지만 선사들은 여전히 GTT의 멤브레인형 화물창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표준 기술로 사용되고 있는 멤브레인형 화물창에 대한 신뢰와 함께 국내 화물창 기술의 운항 이력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조선업계 측 설명이다.
국내 조선사 한 관계자는 "선사들이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 원천기술을 개발해도 새로운 기술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며 "자체 개발한 원천기술로 선박을 건조하려면 선사 측의 별도 주문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선사의 관계자도 "LNG선가가 2000억원이 넘다보니 선사 입장에서도 그동안 써오던 기술을 외면하고 선뜻 국내 기술을 쓰기 어려운 것 같다"며 "다만 로열티 부분은 이미 선가에 다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사에서 지불한다기 보다는 선사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조선사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조선업계는 독자적인 화물창 기술 개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KC-1의 시장 외면을 딛고 보다 개선된 KC-2라는 이름의 독자 화물창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KC-2의 개발 프로젝트에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KC-2 개발에 참여 중인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국내에서 화물창을 개발하게 되면 로열티는 사라지고 선가도 내려갈 것"이라며 "이미 선가에 반영된 로열티지만 새로운 기술을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하면 국내 조선사가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KC-2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수년 간 문제 없이 운항이 돼야 실적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국내에서 개발되는 만큼 우선 국내 발주를 통해 실적을 쌓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