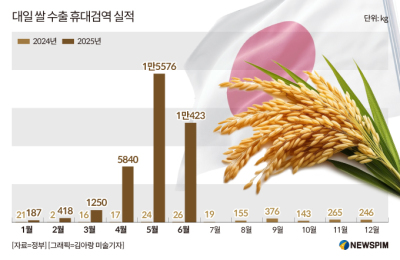[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여자프로골프가 장타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나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타를 쳐야한다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다.
 |
| 박성현 <사진=뉴스핌DB> |
올 시즌 LPGA투어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주 LPGA투어 JTBC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김세영(미래에셋)은 일부 홀에서 300야드 이상을 날리기도 했다. 김세영은 이미 장타자로 잘 알려진 선수. 김세영은 올 시즌 드라이버샷 평균 비거리 279.24야드로 4위다.
대회 때마다 상위권에 오르고 있는 렉스 톰슨(미국)은 287.06야드로 1위다. 시즌 2승인 장하나(비씨카드)는 265.02야드를 날리고 있다. 반면 박인비(KB금융그룹)는 252.09야드다.
JTBC 파운더스컵 최종라운드에서 김세영은 파3홀에서 9번 아이언을 잡았으나 한 조에서 플레이한 선수는 7번 아이언을 잡았다. 보통 2클럽 이상 거리 차이가 난다면 아이언 게임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물론 장타가 다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퍼팅이 같이 따라 줬을 때 우승이 따라 올 수 있다.
LPGA투어의 경우 홀 길이는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전장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장타가 유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
KLPGA투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장타자 박성현(넵스)이 3승으로 상금랭킹 2위에 오른 것도 장타와 무관하지 않다.
박성현은 지난주 LPGA투어 JTBC 파운더스컵에서 공동 13위에 올랐다. 성공적인 미국 본토 무대 데뷔전이었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