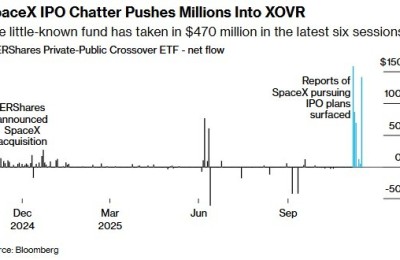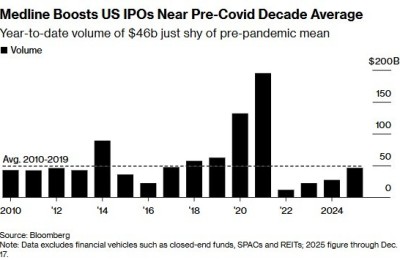‘천재’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3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 ‘노아’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강렬한 에피소드 ‘노아의 방주’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영화는 창조주의 뜻을 받든 인간 노아의 외로운 고뇌에 집중했다. 성서에서 창조주는 타락한 인류를 멸하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아를 선택했다. 성서대로 영화 속 노아는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홍수 이후 번성할 동물들을 거둬들인다. 하지만 감독은 성서를 살짝 비틀었다.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를 거느린 노아는 ‘인류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읊조리는 완고한 인물로 묘사된다. 심지어 창조주의 뜻이라며 가족마저 내던지려 한다.
영화 ‘노아’가 품은 메시지는 노아의 심리변화를 따라가며 차츰 노출된다. 가족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그는 자신을 압박하던 창조주의 뜻과 인간적 고뇌 사이에서 결국 결단을 내린다. “이것만은 못 하겠나이다”라며 내뱉는 원망 섞인 그의 말 한마디는 성서 속 이야기를 통째로 뒤흔든다. 관객은 과연 영화가 노아를 통해 보여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감독이나 메시지만큼이나 눈길이 가는 인물은 주인공 러셀 크로우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로 아카데미의 선택을 받은 그는 ‘뷰티풀 마인드’ ‘신데렐라 맨’ 등에서 디테일한 감정연기의 진수를 보여준 연기파다. 러셀 크로우는 ‘노아’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성서 속 노아와 다른 인물을 보여준다. 캐릭터를 떠나 그의 압도적 존재감은 제니퍼 코넬리와 엠마 왓슨, 안소니 홉킨스, 레이 윈스턴, 로건 레먼을 다 합한 것과 맞먹는다.
몰입을 방해하는 일부 영화적 장치는 아쉬움을 남긴다. 초중반 등장하는 ‘감시자(성서 속 네피림에서 따옴)’들에게서 ‘트랜스포머’와 ‘반지의 제왕2’가 연상돼 실소가 터진다. 특히 시대적 고증에 역주행한 의상에는 혀를 내둘렀다. 당장 밀라노로 직행해도 좋을 세련되고 몸에 딱 맞는 의상들은 성서 속 시대배경과 따로 논다. 이 모든 것이 성서를 비틀고자 했던 감독의 의도인지 궁금하다. 20일 개봉.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