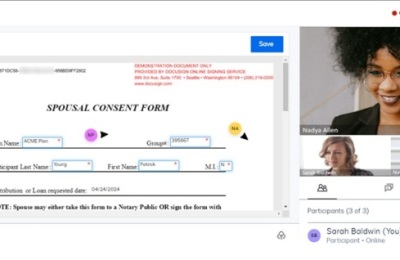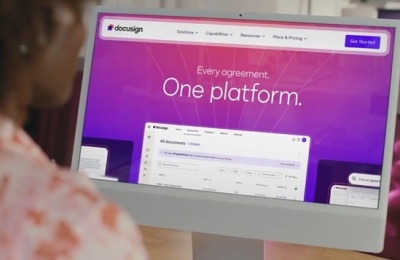[뉴스핌=이종달 기자] 아마추어나 프로나 승부는 퍼트에서 갈린다. 퍼트를 잘하는 골퍼가 이기게 돼 있다. 이게 골프다.
보통 골프장의 파는 72다. 이는 뭘 의미하는 가. 36번의 퍼트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파의 절반이 퍼트인 셈이다. 이를 놓고 보면 골프는 퍼트의 게임이다.
그린 위에서 골퍼는 한없이 작아진다. 퍼트수를 줄이기 위해 별의 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 퍼트가 잘 안 되면 예전에 쓰던 퍼터를 다시 사용하기도 한다. 타이거 우즈(미국)도 그랬다. 또 최경주는 ‘홍두께’ 퍼터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를 3연승한 박인비는 크로스핸드그립을 한다. 보통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는 그립이 아닌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는 그립을 하고 퍼트를 하는 것.
문제는 어떤 퍼터를 사용하든 어떤 그립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퍼트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쳐야 들어간다.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100% 안 들어간다. 스스로 확신할 때 들어가는 게 퍼트다.

‘구멍’은 들어가게 돼 있다. ‘무엇’을 넣든 말이다. 뚫려 있으니까. 없는 구멍을 만들어서라도 넣겠다는 의지와 확신이 필요하다. 음양의 이치를 생각할 것도 없이 볼이 가는 곳에 반드시 구멍이 있다. 볼이 구멍을 향해 굴러가는 게 아니라 볼이 가는 곳에 구멍이 있다. 바로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볼이 가는 곳에 구멍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쉬운가. 또 얼마니 편한가. 구멍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것도 아닌데.
3퍼트로 고민하는 골퍼들은 자신감을 갖고 쳐라. 구멍은 거기 있다. 볼이 가는 곳에.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