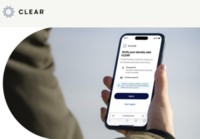[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직접 테슬라 FSD를 켜고 달려보니, 주행은 편안했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이 기술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잘 달리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바뀌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테슬라 모델X에 탑재된 FSD(Full Self-Driving)는 가속과 감속, 차로 변경, 교차로 통과, 고속도로 합류와 진출까지 대부분의 주행 판단을 스스로 수행했다. 운전자는 핸들을 지켜보면서 개입할 준비만 하는 '감독자'에 가까웠다. 차가 스스로 끼어들고 신호를 읽어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동안, 사람은 그저 시스템이 실수하지 않기를 지켜보는 존재로 밀려나 있었다.

이 경험이 불편했던 이유는 기술이 미완성이라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보다 더 자연스럽게 주행을 처리할 만큼 완성도에 가까워졌다는 점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테슬라는 이 수준의 기술을 시험장이 아니라 실제 도로 위에 풀어놓고, 수백만 대 차량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습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가 노리는 것은 자동차 판매가 아니다. 핵심은 FSD라는 '운전 시스템'의 구독화다.
차량은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보급하고, 주행 데이터는 중앙 서버로 모아 알고리즘을 고도화한 뒤, 소비자에게는 연, 월 구독 형태로 자율주행 기능을 판매하는 구조다. 차는 일회성 상품이지만, 소프트웨어는 평생 과금이 가능한 수익원이다. 이 모델이 자리 잡으면 테슬라는 도로 위의 '통행료 징수자'가 된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이 플랫폼이 특정 브랜드에 갇히지 않을 가능성이다. 지금은 테슬라 차량에만 FSD가 탑재돼 있지만, 언젠가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제조사의 차량에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깔리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현대차를 타고 있어도, 매달 자율주행 구독료는 테슬라에 지불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자동차 제조사는 하드웨어 공급자로 밀려나고, 이동의 수익은 알고리즘 소유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특히 지금 한국 도로를 달리고 있는 수만대의 모델 Y에 FSD가 본격 탑재되는 순간, 이 파장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소비자의 기준은 '국산차냐 수입차냐'가 아니라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을 쓰느냐'로 급격히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 변화는 운송 산업 전반을 흔든다. 자율주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택시, 대리운전, 화물 운송, 심지어 버스 기사까지 인간이 수행하던 이동 노동의 상당 부분이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수 있다. 테슬라의 FSD는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노동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기술이다.
FSD를 직접 체험하며 가장 크게 남은 감정은, 이것이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틀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라는 인식이었다. 이 변화는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지만, 시장의 중심은 이미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
chan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