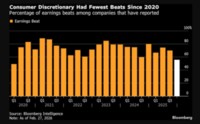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K-방역'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식 코로나19(COVID-19) 방역이란 뜻인데 우리는 한때 세계가 인정한 성과를 보였지만 지금은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다. 과거 성취감에 취한다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법이다.
지난해 3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후 43일 만에 그 수가 5000명에 달했던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상반된 대응을 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경봉쇄와 엄격한 이동통제로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데 안간힘을 썼던 미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적극적인 검사와 접촉자 추적 등 방역체계만으로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
그런데 이는 우리 만의 비결이 아니다.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는 대만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때 경험을 교훈삼아 마스크 자체 양산에 나섰고, 국민들은 적극 착용에 동참했다.
초기 국경봉쇄와 접촉자 추적 등도 확산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됐다. 심지어 격리기간에 있는 확진자가 외출하면 당국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했다. 대만의 7일 평균 신규 확진 사례는 3건, 대부분 입국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다.
경제활동을 멈추지 않고도, 전염병 확산세를 통제했다는 각종 외신들의 관심있는 보도가 나오면서 'K-방역'이란 신조어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 정부와 외교부가 'K-방역'으로 명명한 것이지, 외신 어디에서도 '한국식' '한국만의'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3차 유행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11일까지 나흘 연속 400명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K-방역은 유명무실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꼴찌로 백신 접종을 시작해 늑장대응 비판까지 일었지만 정부는 K-방역의 우수성 언급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남미 국가 칠레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올렸고, 세계 1위국 됐다. 칠레는 일일 평균 전체인구 100명 당 1명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누적 백신 접종 면에서도 칠레는 '백신 선진국'이다. 칠레 인구 100명 당 25명 이상이 최소 한 차례 백신 주사를 접종한 상태다.
다른 국가들이 백신 확보에 주저할 때 칠레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백신 개발 제약사들과 구매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 시노백 백신 6000만회분을 확보했고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2만회분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지난해 24일(현지시간)에 도착했다. 이밖에 아스트라제네카 등 여러 제조사들과 계약을 맺어 전국민 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진작에 확보한 상태다.
백신 확보에 늑장부린 브라질을 보자. 'P.1' 변이 바이러스로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10일 하루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는 2286명을 기록했다. 산소통이 부족해 일부 의료진은 가망없는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야하는 비참한 선택을 한다. 의료체계 붕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이는 브라질 만의 일이 아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브라질을 넘어 세계 20여개국에 퍼진 상황. 확산한 뒤에는 이미 의료체계 마비란 결과를 낳은 뒤다. 대비하지 않으면 늦게 돼있다.
지금은 K-방역 우수성 입증이나 대외 홍보에 나설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간과했고, 현 방역체계에 개선할 점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앞을 보며 고민할 시기다.
코로나 재유행 당시인 지난해 12월 25일,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사태 초기 방역 성공에 취한 나머지 재유행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를 방심하다 마주하기 싫은 상황에 부딪혔다는 의미로 몽유병(sleep-walking)에 비유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단잠에서 깨고 현실을 직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