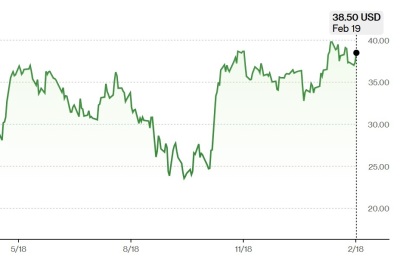[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신의료기관이 병동 내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기능을 차단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피해망상 등에 시달리다 가족과 경찰 등에 의해 모 정신병원에 입원조치됐다. 입원 이후 A씨는 병동 내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수시로 전화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신고했다. 이에 병원 측은 A씨가 112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병동 내 모든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기능을 차단했다.

그러자 A씨는 "병원 측이 부당하게 긴급통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공중전화 긴급통화를 이용해 자주 허위 신고를 하는 탓에 경찰이 출동하는 문제가 반복됐고 결국 긴급통화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병동 내 모든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를 차단한 것은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부 환자에게 긴급통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모든 환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특히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환자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권리인 '안전권'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경찰 등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작 긴급통화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5년 이와 유사한 다른 진정에서도 "정신병원 측이 긴급통화 기능을 차단하거나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화성시에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그 제한은 반드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