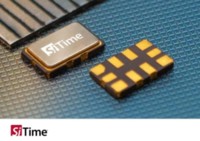자살률 높지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 22%에 그쳐
"정신건강 서비스 공적 투자 상대적·절대적으로 부족"
"우울증 치료에 대한 편견 해소도 함께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윤혜원 기자 = 가수 설리에 이어 구하라까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 관련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정신상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신건강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86억원이 증가한 1740억원이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에 전년 대비 200% 증가한 105억원이, 자살예방사업에 전년 대비 29.8% 증가한 218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은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세계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는 미달 수준이다. 한국의 전체 보건예산 중 정신보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되지 않아 68개국 평균인 2.82%보다 낮았다. 특히 한국이 속해 있는 고소득(High Income) 국가 평균 5.1%와 비교해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국민 1인당 기준으로 살펴보면 더욱 열악하다. 2017년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보건 예산은 388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유럽 지역 인구 1인당 정신보건 지출 평균은 21.7달러(2만5500원)로 약 6.4배 높았다.

관련 인력도 모자라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2017년 기준 2만1814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42.1명이다. 그러나 상근 전문인력은 8365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16.2명 꼴이다. 유럽(50.7명), 고소득 국가(65.5명)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해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인구가 10만명 당 24.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명보다 2배 많은 상황이지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는 22.2%로 캐나다(46.5%), 미국(43.1%)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보건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정신건강과 관련한 편견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정신과적 질병에 대한 공적 투자는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신과적 치료가 전문화된 기술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현실과 반대로 이를 위한 인프라의 양과 질은 모두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상담센터 등 접근성 높은 시설을 늘리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한다고 모든 자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예산 투자를 통해 적극 개입하면 위험에 빠진 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백 센터장은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는 제도를 정착시켜 정신상담에 대한 편견 해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제일 좋은 방안은 이 문제를 겪고 극복해본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저렇게 도움을 받으면 되는구나'하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