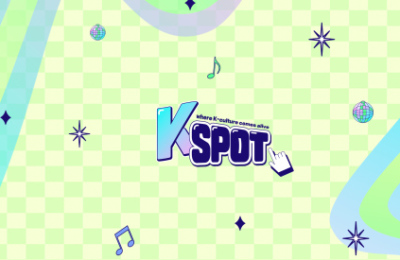합격통보 후 '회사 사정' 핑계로 입사취소...주로 중소기업
고법 "계약서 쓰기 전 채용내정통지도 계약 성립으로 봐야"
피해자 열 명 중 여덟 명이 소송 포기...비용·기간 부담 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청년백수’ A(29·중랑구)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한 출판사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당연히 A씨는 부모와 지인의 축하 속에 설레는 첫 출근을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귀하의 합격이 취소됐음을 알립니다.” 눈앞이 캄캄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했다.
다급한 마음에 회사로 전화했다. 담당자는 “원래 그만두기로 했던 사람이 변심해 어쩔 수 없다”는 상식 밖의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올랐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2년 전 모 언론사에 합격했던 B(30·성북구)씨 역시 일주일 만에 입사 취소를 당했다. 개인사정이 생겨 첫 출근을 늦추려던 게 화근이었다. 사측은 “그럴 거면 다른 회사를 가라”며 매정하게 ‘해고’를 통보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기업이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사취소를 통보하는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구직자의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896명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 후 회사 측의 번복으로 채용이 취소된 경험이 있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전체의 30.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더 큰 문제는 채용 취소를 당하고도 약 80% 정도가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A씨 역시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서둘러 다른 기업에 원서를 냈다”며 “친구들에게 밥도 샀는데 부모님에게 뭐라 말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했다.
흔히 이런 입사 취소통보는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이나 실제 근무하기 전에 벌어져 해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크다. 이상혁 한국노총법률원 노무사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부당해고 사례에 해당한다”며 “서면계약서가 없어도 구직자가 공고를 보고 지원한 뒤 면접을 거쳐 채용확정 통보를 받은 것은 구조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도 채용을 내정한 것만으로 사실상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0년 경영 악화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입사취소를 통보한 건에 대해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구직자가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며 “지원자에게 최종합격통지를 한 채용내정통지는 근로계약 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전문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은 사내 노무사가 있거나 전문 법률서비스를 받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탓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권리를 보호해줄 뚜렷한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써야하는 지 규정이 없다. 특히 중소기업은 입사자가 출근하기 전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드물어 사측이 변심하면 근로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이상혁 노무사는 “중소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낮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구직자가 소송을 걸면 돈 좀 물어주고 말지'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관련 민사 소송이 길게는 2년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구직자 열에 아홉이 문제제기 자체를 포기한다”며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