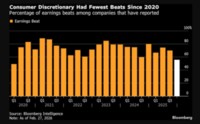|
[뉴스핌=이지은 기자] “제가 하는 캐릭터에 대해 주변의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너무 재밌는걸요. 제가 잘하는 부분이니까 더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우물만 파니까 되더라고요.”
미워할 수 없는 악역이다. 조금은 코믹적인 요소가 가미된 캐릭터. 인교진(38)이 최근 종영한 KBS 2TV ‘저글러스’를 통해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 이번 작품에서 그가 맡은 인물 조상무는 YB 광고 기획부 전무로 의리보단 승리, 남보다는 내가 먼저인 기회주이자이다.
“악역인데 연기톤을 잡는 것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마냥 나쁘기 만한 사람이 아니라 약간 허당끼가 있어야 했거든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촬영이 끝나고 나니까 다들 괜찮다고 얘기해주셔서 마음 놓고 진행했어요.”
‘저글러스’에서 인교진을 떠올리면 마지막회 감옥 회개 장면과 바로 유쾌하면서도 어딘가 얄미운 웃음소리이다. 여기에는 장면에,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이 더해졌다.
 |
“눈물 연기는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눈물 연기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안 해본지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어요. 극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잘하려고 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방송을 봤는데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하하. 그리고 극 중에서 특유의 웃음소리는 조금 더 과장되게 했어요. 감독님의 지시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직접 해석했죠. 유쾌하게 봐주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조상무 전무는 그렇게 입체적인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인교진은 조 전무를 입체적으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인생 캐릭터’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다. 그는 “다채롭게 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사실 제가 연기한 것 보다 텍스트 상으로 본 조상무는 다채롭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저것 캐릭터에 많이 넣은 부분이 있죠. 문을 열 때 발로 차거나, 웃음소리, 그리고 남치원(최다니엘)에게 갑자기 반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조상무보다 다채롭게 하고 싶었어요.”
 |
‘저글러스’는 처음부터 기대작은 아니었다. 감독과 작가의 입봉작이었고, 첫 방송 시청률 역시 다소 저조했다. 하지만 동시간대 1위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인교진에게도 이번 작품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배우도, 제작진도 단합이 너무 잘됐어요. 어느 하나 엇나가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이 팀이라서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글러스’는 저한테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KBS에서 4부작(백희가 돌아왔다), 8부작(란제리 소녀시대) 드라마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는 16부작이 기준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감을 보여준 건 ‘완벽한 아내’와 이번 작품 ‘저글러스’에요. 저에게 완성품 같은 작품이라 의미가 있죠.”
인교진은 앞선 작품 ‘백희가 돌아왔다’에서부터 사투리를 쓰는, 능글맞으면서도 코믹한 캐릭터로 대중을 만났다. 계속해서 망가지는 이미지로 작품을 나올 때마다 주변의 반응 역시 걱정이 많지만, 인교진은 전혀 개의치 않아했다.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이번 ‘저글러스’에서도 조상무 전무에 ‘충청도 공고출신’이라는 서브 텍스트가 있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코믹한 캐릭터만 하면 지겹지 않냐, 걱정되지 않냐 물어보는데 전혀요. 너무 재밌는걸요. 지금 제가 하는 캐릭터가 인교진스럽잖아요. 하하. 앞으로도 제가 잘하는 부분이니까 더 잘해보려고요. 마다하거나 안하진 않을 거예요.”
 |
지난 2000년 MBC 2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어느덧 19년차가 됐다. 이 자리까지 오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공채로 시작을 했는데 친구들은 대학을 다니다 입사를 하고, 월급을 받고 점점 성장하는데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정체된 느낌이 들었어요. 공허함이 들더라고요. 괴리감을 느끼는데, 스스로 감당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진짜 별 생각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자존감도 낮아져 있었어요. 배우로서 자신감이 그나마 있었던 게 25살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현실의 벽에 많이 부딪혔죠. 여러 상황들이 힘들었고, 그런 시간을 겪으니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자, 잘 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든 시기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빛을 봤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의 노력이 빛을 본 순간이다.
“한 우물만 파니까 되더라고요. 내공이 쌓이는 건지 실력이 늘은 건지 모르겠지만요. 하하. 한 우물만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을 시작했으면 진득하게 하는 건 본인 몫이에요. 주위 사람들도 믿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두 딸이 배우를 한다면 한 우물만 파라고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아버지가 20대 초반에 배우를 시작해서 39살에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됐다.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든 직업이다’라는 걸 말이죠.”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사진=키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