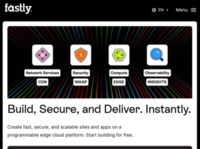일상에 흔히 보이는 것들로 뫼비우스적, 그 이상의 상상 여행을 하려 한다. 주변의 사물들엔 저마다 독특한 내력이 숨어 있고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 보석이 되기도 하고 나침판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출발한 여행의 과정에 어떤 빛깔의 풍경이 나타날지, 그 끝이 어디까지 다다를지 필자 자신도 설레인다. 인문학의 시대라고 하는데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메타적 성찰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사물과 풍경, 시대와 인문을 두루 관통하면서 색다르면서도 유익한 여행을 떠나려 한다.
어릴 적에 뒤에서 누군가 갑자기 두 손으로 내 눈을 가리는 장난을 치곤 했다. 그 순간 마치 시력을 상실한 듯 앞이 캄캄했다. 기습적으로 당한 만큼 아찔한 공포 속에 상큼한 스릴이 담겨 있었다. 콘텍트 렌즈가 보급된 지금은 그런 장난이 위험할 것이다. 지금도 지속되는지 모르겠지만 추억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
개화기 때 서울에 가로등이 처음 켜진 날 그 자리에 있던 시민들은 놀라움이 컸을 것이다. 그 순간의 충격과 감격을 오래 잊지 못할 것이다.
이것들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청소년기에 극장에서 느껴진 감각이.
영화 표를 끊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밝은 대낮의 빛에 익숙해 있던 눈은 어둠을 맞자 마치 시력을 상실한 듯 사방이 깜깜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둠 속의 사물이 인지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영화 관람을 마치고 극장을 빠져나온 순간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햇빛이 너무도 시린 것이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은 밝은 대낮의 빛을 견디지 못해 감긴듯 가늘어진다. 실눈을 통해 주변이 순간 마치 하얀 색처럼 보인다.
어둠과 빛의 폭력에 눈이 감당 못한 셈이다. 눈이 순간 적응이 되지 않아 어둠과 빛의 실체를 무서우리만치 섬뜩하게 겪은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시력이 점차 복원되어 원래의 풍경을 볼 수 있게 된다. 영화 자체도 즐거웠지만 빛과 어둠 속에서의 낯선 혼돈, 그 역시 내겐 상큼한 경험이었다.
그것이 사라지다시피한 것이 현대의 극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즘의 극장은 입장하기 이전부터 시각을 어둠에 서서히 익숙하는 것이 많다. 옛날처럼 대로에서 매표소의 표를 사면 바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복합 쇼핑몰 안에 대개 들어있어서이다. 물론 아직도 옛날 방식의 극장이 있긴 하다.
극장 단독으로는 수입이 나기 어려울 것이다. 극장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넓은 부지에 건축비가 제법 든다. 옛날에야 땅값도 싼 편이고 극장도 드물었기에 경쟁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극장도 많이 생기고 티브이, SNS 등 경쟁 상품들이 많고 땅값도 비싸기에 극장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쇼핑, 식사 등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 쇼핑몰 안으로 이동해 간 것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중의 하나가 상기한 시각 체험의 상실이다.
극장 관계자의 입장에서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문제 거리도 아닐 것이다. 일반론으로 삼기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사소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 보인다. 인류의 문명사는 그런 감각을 잠깐 동안 갖다가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풀어보자.
태곳적부터 사람은 자연적인 빛과 어둠에 익숙해 있었다. 불이 발견되었지만 그것을 전복시킬만한 힘은 되지 못했다. 자연 속에 약간의 작위를 첨가한 정도였다. 등잔불이나 촛불 등등으로 진화해도 대동소이했다.
전기가 발견되어 전깃불이 나오면서 자연적인 그것에 교란이 생긴다. 빛과 어둠의 자연적인 질서가 깨어진다. 서울에 가로등이 처음 들어오는 걸 목격한 시민들의 놀라움엔 그런 혼란 역시 섞였을 것이다. 극장 안에 들어서거나 극장 밖으로 나설 때 시각에 덮치는 어둠과 빛의 폭력 속에서의 낯섬도 같은 선상에 있다.
현대는 빛과 어둠의 마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낮이건 밤이건 빛과 어둠의 모자이크 속에 우리는 산다. 빛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어둠도 그렇다. 빛과 어둠 모두 우리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느낌 속에 산다.
사진의 경우가 보다 실감날 것이기에 사진을 통해 간단히 부연해보자.
구한말의 어느 시골에 사진관이 처음 들어섰을 때 사진관 곁에서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 있다. 공포에 절은 표정들이었다.
사진과 사진관의 존재는 그 시절엔 대개 공포 이상이었다. 영혼을 앗아가는 괴물이었다.
그같은 사진이 점점 인정되면서 가로등이 처음 켜질 때같은 감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후 현대화된 것이다.
이런 대강의 흐름이 틀리지 않다면 극장 초기 시절 우리의 눈에 와닿던 즉물적인 느낌은 빛과 어둠에 대한 인류의 감각의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것이다. 전기가 발견되기 이전의 장구한 세월을 빛과 어둠에 대한 외경 시대라고 부르고 싶다. 전기가 발견되어 다양하게 활용된 초기 시절은 빛과 어둠에 대한 순진의 시대라고 불림직 하다. 그 이후는 빛과 어둠의 범람 시대라고 불려질 수 있겠다. 극장 초기 시절의 빛과 어둠에 대한 즉물적 느낌의 시대는 순진의 시대에 해당될 것이다.
서울에 가로등이 두 번째 켜진 날 시민들은 역시 놀랐겠지만 첫날 같지는 않을 것이다. 첫날의 벅찬 감격이 서서히 사그러들 것이다. 지금의 서울 시민들은 저녁에 가로등이 켜지는 것에 대해 거의 무감각할 것이다. 인류사에서 진짜 경이로운 충격이 일상에 포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도스(DOS)가 나올 때, 스마트폰이 나올 때, 인공지능 등등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큰 맥락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며 이런 것들은 그 거목 아래에서 새롭게 뻗어나간 나무들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가로등에 쓰이는 전기나 사진, 영화 모두 빛과 어둠을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다.
전기는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 사진은 어둠과 빛을 활용해 풍경을 기록한다. 영화는 어둠과 빛의 작품인 사진의 동영상 예술이다.
가로등 같은 조명 기구들의 발전과 범람. 사진의 발전. 영상의 발전. 더욱이 이런 것들은 광고의 발전과 범람과도 관계가 깊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사회는 빛과 어둠의 화려한 범람 속에 있는 것이다.
삶이 영화같다는 말도 종종 쓰인다.
실재가 환상으로 대체되었다고도 한다. 시뮬라시옹이란 말로 그런 현상을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사람마다 물론 취향이 다 다를 것이다. <윌든>을 쓴 소로우처럼 빛과 어둠의 외경에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고 빛과 어둠의 순진 시절에 마음을 적셔보는 사람도 있다. 빛과 어둠의 범람 속에 화려하게 들끓는 에너지의 축제인 포스트 모던한 삶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 개인의 취향은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문명이 지나치게 질주를 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때로 달리던 말에서 내려도 놓을 것이다. 인디언의 격언엔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 내려 뒤를 돌아다 본다고 한다. 자기 영혼이 따라오나 보기 위해서이다. 문명의 말(馬)에서 가끔 내려 뒤를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 문명 자체를 타고 있는 말에서 일단 내려보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빛과 어둠의 순진 시대라고 내가 임의로 이름 붙인 시기. 그 무렵 역시 혼란 속이며 무수한 것들이 뒤섞인채 들끓긴 했을 것이다. 상큼한 기습인 듯 짧아서 안타깝고 순진한 면이 있는 만큼 거울로 삼기에 훌륭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 보인다.
이명훈 (소설 ′작약도′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