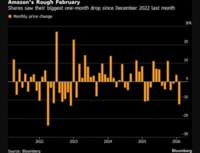[뉴스핌=김세혁 기자] 남의 집 자손을 대신 낳아주곤 하던 1960년대, 두 아이를 차례로 잃은 최막이 할머니는 죄책감에 작은댁을 들인다. 막이 할머니는 자기 대신 2남 1녀를 낳아준 작은댁 춘희 할머니가 고마웠다. 그러던 와중에 일찍 세상을 등진 남편. 막이 할머니는 정신장애 탓에 하루라도 혼자 두기 불안한 작은댁을 차마 돌려보내지 못했다. 두 할머니의 애매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됐고, 46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워낭소리’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이을 감동 다큐 ‘춘희막이’가 30일 객석을 찾아온다. 이미 공중파 방송을 통해 소개됐던 최막이 할머니(90)와 김춘희 할머니(71)의 이야기를 스크린을 통해 만난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할머니의 극명한 성격은 자칫 늘어질 수 있는 다큐멘터리에 탄력을 준다. 요즘 말로 ‘시크’하고, 구박에 욕도 서슴지 않는 막이 할머니는 영화의 카리스마를 담당한다. “콱 쥐박아뿔라(쥐어박을까보다)” “대가리(머리) 대라. 대가리” 등 입만 열면 독설이 한보따리 튀어나온다.

‘춘희막이’의 관객은 늘 작은댁을 구박하는 막이 할머니의 본심이 영화의 중후반 슬슬 드러나면서 먹먹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김광민의 아름답고 애잔한 피아노 선율이 두 할머니의 인생을 노래하듯 이야기에 따라 흐른다. 꾸미지 않아 진솔하고 그렇기에 더 아름다운 두 할머니의 이야기 ‘춘희막이’는 30일 개봉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