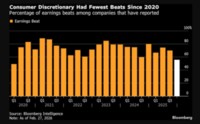[뉴스핌=글 장주연 기자·사진 이형석 기자] 배우 김고은(24)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외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딘가 조금 느릿느릿한 말투, 그러면서도 돌려 말하지 않는 솔직한 화법,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함은 상대를 순식간에 매료시킨다. 여기에 쉴새 없이 깜빡이는 눈과 코를 찡긋하는 버릇은 그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런데 정작 대중이 만나는 김고은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스크린 속 그는 좀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더 솔직히 말하면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다. 어느 누가 위대한 시인의 세계를 동경해 70대 노인 앞에서 관능미를 뽐내는 열일곱 소녀(영화 ‘은교’)나 자신을 건드리면 앞뒤 재지 않고 들이대 ‘미친X’ 소리를 듣는 이(영화 ‘몬스터’)를 알고 싶겠는가.
그나마 이번엔 ‘가족’으로 묶어져 있다기에 조금은 친근하고 귀엽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또 틀렸다. 남자와 주먹다짐을 하고 살인에도 능하다. 김고은은 신작 ‘차이나타운’(제작 폴룩스픽쳐스, 제공·배급 CGV아트하우스)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서슴지 않는다. 오는 29일 개봉하는 영화는 오직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차이나타운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여자의 생존법칙을 그린다.
“사실 멜로인 줄 알고 시나리오를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운명이다 싶었죠. 일부러 강하고 딥한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세 편이나 개봉하게 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작품을 선택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죠. 의도한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죠. 뭐(웃음).”

극중 김고은은 쓸모없어 세상에 버려진 아이 일영을 연기했다. 지하철 10번 보관함에 버려져 ‘일’하고 ‘영’을 합친 일영이 이름이 됐다. 노숙자들 틈에서 지내다 차이나타운으로 팔려간 그는 그곳에서 엄마라고 불리는 여자(김혜수)를 만나 식구가 된다. 그렇게 일영은 엄마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강인한 아이로 자란다.
“일영에게서 연민이 느껴졌어요. 나와는 다르지만 인정하게 되는 아이였죠. 체력적인 건 전혀 문제가 안됐어요. 전작들이 더 힘들고 액션 분량이 많았거든요. 물론 이번이 처음이었으면 힘들다고 느꼈겠지만, 워낙 단련돼 있어서 괜찮았죠. 아, 담배 피우는 신은 연기 때문에 힘들긴 했어요. 근데 영화 보고 담배 끊었던 사람이 다시 피우고 싶다는 거예요. 기분 되게 좋던데(웃음).”
단련된 체력으로 신체적 고통을 이겨냈다면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바로 엄마를 연기한 김혜수 덕분이다. 지난 ‘몬스터’ 프로모션 당시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혜수 선배와 작업해 보고 싶다”는 말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지 못했다. 더욱이 김혜수는 자신의 촬영이 없는 날에도 촬영장을 찾아 힘을 실어줬다. 김혜수는 후배를 살뜰히 챙겼고 김고은은 그런 선배를 믿고 따랐다.
“믿기 어려울 만큼 좋았죠.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선배는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고요.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분이랄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에게도 한마디씩 힘이 되는 말을 해주셨죠. 당 떨어진다고 젤리도 챙겨주시고(웃음). 근데 그런 게 한참 후배 입장에서 큰 힘이잖아요. 그래서 촬영 과정이 더 즐거웠고 힘들었던 기억이 없나 봐요.”

‘은교’로 데뷔 후 약 2년간의 공백을 가졌던 그는 지난해부터 다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몬스터’ ‘차이나타운’에 이어 올해 ‘협녀:칼의 기억’으로 또 한 번 관객을 만날 예정. 그리고 오는 29일에는 제주도로 내려가 영화 ‘계춘할망’ 촬영에 들어간다. 내친김에 드라마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도 제법 긍정적인 답변으로 여지를 남겼다.
“정말 거짓말 아니고 드라마 엄청 좋아해요. 힐링 타임이 드라마 보는 거라니까요. 특히 몰아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커피프린스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의 드라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7회를 10번 봤어요. 우울할 때마다 보거든요. 드라마 현장에도 자주 놀러 가고요. 드라마도 매력적인 매체라는 걸 아니까 좋은 작품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어요. 찾아보고도 있고요. 말랑말랑한 역할도 해봐야죠(웃음).”
[뉴스핌 Newspim] 글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사진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