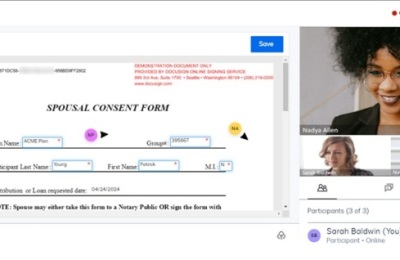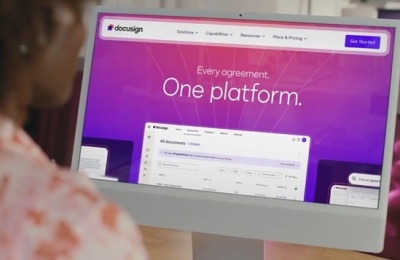[뉴스핌=이종달 기자] 주말골퍼들이 버리지 못하는 병폐가 있다. 파4홀에서 두 번째 샷을 온그린 시키려는 것. 그린까지 남은 거리에 상관없이 온그린을 시도한다. 그린까지 거리가 길면 페어웨이 우드를 잡아서라도 온그린을 노린다.
뭐 목표가 뚜렷한 건 좋다. 하지만 주말골퍼의 온그린 집착은 골프 자체를 망치기 일쑤다. 누구나 한 두 번 해보면 안다. 이 볼이 그린이 올라갈 것인지 아닌지를.
어쩌다 올라가는 요행을 버리지 못해 무리한 시도를 한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볼이 그린 주위 벙커에 빠지는 등 수습불가로 만든다.
파4홀에서 A씨의 두 번째 샷이 그린 주위 러프에 떨어졌다. 그린까지는 20m 정도. 하지만 앞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버티고 있다. 나무를 피해 샷을 하려니 벙커가 도사리고 있다.
이때 A씨의 선택은 무엇인가.
물론 샷을 아주 잘 한다면 나무와 벙커를 피해 볼을 그린에 올릴 수 있다.
이때 많은 주말골퍼는 나무와 벙커의 좁은 사이로 온그린을 시도한다. 말도 안 되는 공략이다.
이럴 경우 꼭 볼을 그린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린에 올려도 홀까지는 15m 이상의 롱퍼트를 해야 한다. 15m가 넘는 롱퍼트나 15m 짜리 칩샷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롱퍼트나 칩샷 보다 홀에 붙이는 것이 관건이다.
주말골퍼의 경우 아무리 거리가 길어도 일단 온그린만 되면 좋아한다. 그린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온그린을 못 시키면 얼굴이 어두워진다.
다시 말해 20m 짜리 롱퍼트나 20m 짜리 쇼트 어프로치는 크게 다르지 않다. 20m에서 2퍼트나 칩샷 후 1퍼트나 타수는 같다. 20m 거리를 2퍼트로 끝낼 정도면 쇼트 어프로치로 홀에 붙어 1퍼트로 마무리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앞서 A씨의 선택은 분명하다, 더 큰 트러블 샷을 피하는 것. 그것은 그린 근처까지만 가면 된다는 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