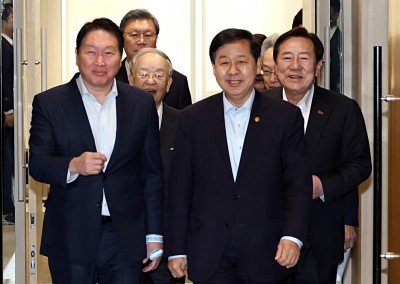[뉴스핌=김선엽 기자] 200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후 오랜만에 증세논쟁이 뜨겁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자 결국 유리지갑 털기냐는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8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부자감세'가 주된 화두였던 만큼 특별히 조세저항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종부세 도입을 두고 사회 전체가 뜨겁게 달아올랐었다.
 지금과 차이는 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는 세원확보보다는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박근혜정부의 증세는 복지공약의 재원마련이라는 발등의 불을 꺼야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차이는 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는 세원확보보다는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박근혜정부의 증세는 복지공약의 재원마련이라는 발등의 불을 꺼야하는 상황이다.
현 정부로서는 약속했던 복지정책을 거둬들일 것인지, 아니면 조세저항을 무릅쓰고 '더 걷는' 쪽으로 계속 나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다.
정부의 무리한 세원확보 공언(空言)도 한몫 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직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2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세무당국은 전문인력 400명을 증원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올 상반기 세수는 작년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어쩌면 우린 알고도 속아줬는지 모르겠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정부는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을 손대지 못했다. 2005년 종부세 이후 참여정부가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 가는 모습을 옆에서 목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내수투자에 ‘고용률 70% 달성’이란 정권의 목표가 걸려있는 만큼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와 '역시 공짜 점심은 없었다'며 모든 증세안을 폐기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백지화하기에 이미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왔다. 이미 2011년 서울시장 선거와 2012년 대선을 통해 복지국가를 향한 전국민의 열망은 확인됐다.
더군다나 2000년대 초반의 신자유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사회 근간을 밑바닥부터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 즉 다른 나라보다 낮은 세율로 해외자본을 유치해 우리경제의 장기성장률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이제 포기할 때가 됐다.
이제 '복지재원 마련'이란 사회적 동의의 절차들을 밟아가야 한다. 복지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인력이 기업들에 공급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우리사회가 치러야 하는 각종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결국 기업과 고액자산가도 복지국가의 수혜자다.
국민과 기업을 이분법화해 세법개정에 따른 단기적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우리사회 공동의 장기성장 플랜을 마련할 때다. 이제 막 움트는 복지사회 선순환의 꼬리를 벌써부터 싹둑자르고 볼 일이 아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