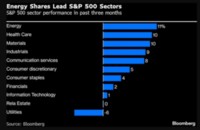[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항공우주(이하 KAI) 매각을 위한 예비실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 KAI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가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의 예비실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항공우주(이하 KAI) 매각을 위한 예비실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 KAI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가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의 예비실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은 KAI 인수를 위한 예비실사를 진행 중이지만, KAI 노조 측의 실사 저지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KAI 연내 매각이 물 건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KAI 노조, 예비실사 저지
KAI 인수를 위한 예비실사는 지난달 25일 시작됐다.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의 오리엔테이션과 KAI 관계자 및 기무사의 보안점검을 기점으로 예비실사의 막이 오른 것이다.
KAI 노조는 그러나 민영화 계획 자체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4주간 실사 저지를 위한 릴레이 상경 집회 계획을 발표,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KAI 서울사무소를 점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실사 저지에는 KAI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사천에서 상경한 노조원, 서울 근무 노조원 등 약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예비실사 저지는 지난 1일 본격적으로 실행됐다. 예비실사 6일차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은 KAI 노조원 일부가 서울사무소 내 실사장 열쇠를 보관하는 사무실을 점거, 열쇠 반출을 봉쇄해 실사를 진행하지 못 했다.
이에 대한항공의 KAI 인수 주간사 메릴린치는 산업은행에 항의 및 해결을 촉구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지난 2일에도 KAI 노조의 실사 저지는 계속됐다.
KAI 노조의 실사 저지에 매각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금융공사 진영욱 사장은 김홍경 KAI 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금융공사의 이같은 조치로 KAI 예비실사는 재개됐지만 KAI 노조는 실사장 보안요원 감금, KAI 내부 실사 추진팀 업무 진행 감시 등으로 여전히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 때문에 언제든 예비실사 재중단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 예정된 KAI 노조집행부 선거는 예비실사 저지는 물론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강경투쟁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KAI 민영화 반대…왜?
지난 1999년 설립된 KAI는 지난해 매출 1조 28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 가도를 달려오고 있다.
최근엔 2200억원대 KT-1 기본훈련기를 페루에 수출하고, 170억원대 군수지원 사업을 따내는 등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다.
KAI는 그러나 현재의 궤도에 오르기까지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 KAI 노조가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KAI는 90년대 말 삼성, 현대, 대우 등 당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항공사업 분야를 통합해 탄생했다. 때문에 설립 초기 KAI 공장은 서산, 창원, 사천 등에 분산돼 있었다.
이를 지금의 사천공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KAI는 구조조정을 거쳐야 했다. 한때 3600명에 달하던 직원은 지난 2006년 2100명까지 줄었다. 폴란드와 이스라엘 등에선 사업 실패라는 쓴 맛을 보기도 했다.
KAI의 이같은 경험은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양분이 됐다. 각종 훈련기 수출은 물론 보잉, 에어버스와의 협업을 통해 KAI는 올해 매출 1조 7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엔 2조원, 오는 2015년엔 매출 3조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KAI 관계자는 "구조조정, 해외사업 실패 등의 경험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온 입장에선 민영화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며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KAI를 제대로 평가하고 키울 수 있는 회사로 인수되고 싶다"고 말했다.
KAI 인수 후 투자계획 역시 중요한 문제다. 향후 KAI는 한국형 전투기, 소형 무장(공격형) 헬기, 중형 항공기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KAI가 분담해야할 자금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이러한 자금 여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게 KAI의 입장이다.
KAI 관계자는 "인수 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물론 미래에 예정된 사업까지 추진할 후속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며 "인수금 외에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