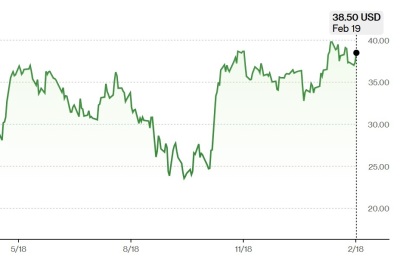대한민국의 국토 구조는 수십 년간 한 방향으로 기울어 왔다. 수도권 일극체제다. 인구와 자본, 기업과 대학, 문화와 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며, 시간이 갈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고착되고 있다.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 경쟁력의 위기다.
부산과 경남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산은 항만과 관광, 금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인구 감소와 성장 정체에 직면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이라는 강한 산업 기반을 지녔지만 청년 유출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현실을 공유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지금이 적기인 이유는 분명하다. 인구 감소는 더 이상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다. 학교와 상권이 줄고, 기업의 투자 판단은 갈수록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구역을 나눈 채 각자 대응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부산과 경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작동하고 있다. 출퇴근과 물류, 소비와 문화, 교육과 의료는 행정 경계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과 예산, 행정 결정은 여전히 분리돼 있다.
같은 공간을 두고 서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유사한 사업에 중복 투자하며, 광역 교통과 산업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비용으로 누적된다. 행정통합은 새로운 결합이 아니라, 이미 결합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이다.
필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의 경쟁력은 행정구역의 크기가 아니라 인프라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도로와 철도,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와 주거지는 행정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생활권과 경제권은 이미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데, 행정만 분리돼 있을 경우 비효율은 불가피하다. 부산과 경남은 교통·물류·산업 인프라가 촘촘히 연결된 하나의 도시권이며, 행정통합은 이를 하나의 전략 아래 정렬하는 일이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통합은 필요조건에 가깝다. 지방의 경쟁 상대는 인접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다. 개별 광역자치단체가 각자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수도권과 구조적으로 맞서기 어렵다. 반면 부산과 경남이 행정·재정·산업 전략을 하나로 묶을 경우, 인구 800만 명에 육박하는 메가시티가 형성되고 국가 정책과 투자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그 자체로 완결된 목표가 아니다. 울산까지를 포함한 동남권 통합을 전제로 지금부터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다. 부산의 항만과 금융, 경남의 제조업, 울산의 에너지·중화학 산업은 이미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돼 있다.
이를 나중의 문제로 미루거나 단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이해 충돌과 정책 지연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처음부터 울산을 포함한 통합 구상을 분명히 해야만 수도권, 특히 서울시에 대응할 수 있는 단일 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행정통합과 관련한 일정 로드맵과 재정·행정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광역 단위 구조 개편을 국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먼저 논의하고 준비한 지역이 제도와 재정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민에게 행정통합은 다소 추상적인 논의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현실로 나타난다. 광역 교통망이 하나의 계획 아래 추진되고, 산업 정책이 중복 없이 정비되며, 청년에게는 더 넓은 양질의 일자리 시장이 열린다. 반대로 통합을 미루면 현상은 유지되지 않는다. 지금의 구조는 서서히 약화될 뿐이다.
행정통합은 지역의 정체성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경남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남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일이다. 언젠가 해야 할 과제라면, 그 시점은 지금이어야 한다. 부산·경남, 그리고 울산을 함께 묶는 행정통합 논의, 지금이 바로 적기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