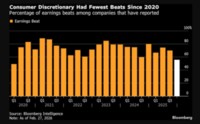[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경제가 3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발언의 연장선 상이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 23일 우리나라 2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를 겨냥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분기 성장률은 1분기의 -1.3%보다 더 악화되는 등 2분기 연속 역성장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3.3% 성장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만의 최저 수치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2분기의 악화된 성장률의 기저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달말과 8월초에 발표될 각종 경제관련 지표들의 긍정적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지는 의문이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한국경제의 회복을 예상할 만한 뚜렷한 징후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문 대통령은 "각종 경제지표들도 2분기를 저점으로 6, 7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라며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어두운 마이너스 역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을 반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했다. 홍 부총리의 보고내용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낙관론을 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2분기를 시작으로 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중 경기를 반등시키겠다"고 장담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경제의 앞날은 아직도 암울하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 냉담하다.
혹시라도 정부가 재난지원금 효과로 일시적인 내수 회복 지표를 믿고 경제회복의 낙관론을 폈다면, 가당치 않다. 2분기 성장률 하락은 수출과 투자 감소가 직접적 원인이 됐다. 2분기 수출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영향으로 56년 만에 최대 수준인 16.6%나 급감했다. 6월 수출이 10.9%로 감소폭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두 자릿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펜데믹이 진정된다는 전제 하에 경제 회복론을 폈지만, 위기국면이 끝날 조짐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방역전문가들은 올 가을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재확산을 언급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간 갈등 심화로 글로벌 무역의 회복 전망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는 심리'라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재우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팀수장의 낙관론이 필요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경제 회복은 기대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고 경제운용계획을 다시 짜는 등 행동이 따라야 한다. 홍 부총리는 3분기 경제회복 전망의 근거로 추경과 한국판 뉴딜 등 정책효과를 꼽았다. 하지만 돈은 이미 풀 만큼 풀었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으로는 안된다는 것도 이미 증명됐다. 이제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치공학적 정책이 아니라 오롯이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풀고,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마인드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노동계를 설득해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풀어야 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정책적 변화 없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비 오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 농업처럼 '희망고문'일 뿐이다. 오기로 버틸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