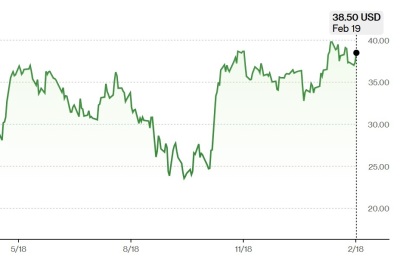약 10cm의 잔디를 조성하는 US오픈·브리시티오픈 코스와는 판이
 |
11일 오거스타GC에서 마스터스가 열립니다. 최고의 대회라는 자부심과 함께 여러가지 독특한 면이 있는 대회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이 출전하는 PGA 마스터스 대회 현장을 특파원을 통해 생생하게 전합니다.
[미국=뉴스핌] 김경수 특파원=남자골프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에는 독특한 것이 많다.
마스터스 골프 대회는 엄밀히 말하면 ‘프라이빗 골프장이 주최하는 프라이빗 대회’다. 대회에 적용되는 골프규칙만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골프협회(R&A)에서 정한대로 할 뿐 나머지는 대회를 여는 오거스타 내셔널GC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용어만 해도 그렇다. 마스터스에서는 갤러리를 패트론, 후반 나인을 세컨드 나인, 러프를 세컨드 컷으로 부른다.
오거스타 내셔널GC는 여느 미국PGA투어 대회 코스와는 달리 러프가 거의 없는 편이다. 볼이 페어웨이를 벗어나도 숲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게 칠 수 있다.

오거스타 내셔널GC가 8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해 러프(세컨드 컷)의 잔디 길이는 약 3.5cm다. 예년과 같다. 이는 다른 메이저대회인 US오픈이나 USPGA챔피언십·브리티시오픈에 비하면 러프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골프볼의 직경이 약 4.3cm이므로, 볼이 러프에 빠져도 잔디에 묻혀 보이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마스터스의 러프가 러프답지 않은 것은 대회 창설자이자 오거스타 내셔널GC를 공동설계한 보비 존스의 지론 때문이다. 존스는 골프 코스에 인공을 가미하는 것을 싫어했다.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한 채 코스를 만들었다. 대회를 위해 러프의 잔디를 길게 조성하거나, 코스 설계 때 연못에 파일을 박아 인공적인 그린을 만드는 것 등을 배제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거스타 내셔널GC에는 원래 있던 개울이나 연못 외에 골퍼들을 압도하는 인공적인 페널티구역이나 아일랜드 그린 등을 찾아볼 수 없다.
러프도 그 연장선이다. 대회를 위해 일부러 잔디를 기르기보다는 페어웨이와 구분할 수 있을만큼만 조성한다. “오거스타 내셔널GC의 러프는 퍼블릭코스의 페어웨이 수준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US오픈과 US여자오픈을 주최하는 USGA의 코스 셋업과는 사뭇 다르다. US오픈 개최코스는 러프를 보통 3단계로 나눈다. 페어웨이와 인접한 곳이 인터미디어트 러프(잔디 길이 약 3cm), 그 바로 밖이 프라이머리 러프(잔디 길이 7∼8cm), 그리고 페어웨이에서 가장 멀고 긴 풀로 된 메인 러프(잔디 길이 10cm이상)가 그 것이다. 이 경우 인터미디어트 러프를 퍼스트 컷, 프라이머리 러프를 세컨드 컷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거스타 내셔널GC에는 러프가 한 구역만 있고 그마저도 잔디 길이는 3.5cm에 불과하므로 세컨드 컷은 US오픈 코스의 인터미디어트 러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린 스피드도 오거스타 내셔널GC는 스팀프미터 기준으로 12∼13피트로 조성된다. 그 반면 US오픈은 14∼14.5피트로 셋업된다. 표면적으로는 US오픈 코스의 그린이 더 빠르다. 그런데도 오거스타 내셔널GC의 그린을 유리판에 비유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골퍼들은 오거스타 내셔널GC의 그린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린의 굴곡이 심하고, 그린 표면을 다지는 롤링 작업 등의 변수가 있긴 하다.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는 러프다운 러프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82회를 치르는 동안 한 해 나흘 내내 60타대 스코어를 낸 선수가 한 명도 없다. 러프 외에 다른 변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