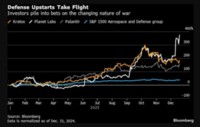전자공시시스템으로 '공시 안방조회' 시대 열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1997년 말 2145개였던 금융회사가 2003년말 1409개, 2008년말 1338개로 줄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몰아친 결과다. 수많은 금융사들을 수술대에 올린 것은 금융감독원이다. '국가 위험관리자'로 나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사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강화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 금감원은 금융사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편, 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체질개선에 나섰다.
구조조정 결과 1998년부터 2003년까지 14개 은행을 포함한 840개 금융회사가 합병, 자산부채이전, 청산 등을 거쳐 퇴출됐다. 동화·동남·상업·한일·서울은행 등이 이 시기에 사라졌다. 해당 은행들은 경영정상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아래 자산과 부채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시키거나, 정상화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받아 다른 은행과 합병되는 수순을 거쳤다.
2003년 이후에는 2차 구조조정이 이어졌다. 부실금융기관의 퇴출보다는 합병이나 지주사 체제 전환 등이 주류를 이뤘다. 금융지주회사법이 신설되면서 2008년 말까지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광주, 제주, 경남 등 7개 은행이 금융지주사 자회사로 편입됐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들에도 경영합리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진행케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를 만들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금융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미리 마련한 셈이다. 은행의 경우 미래 손실해 대비해 준비자금을 넉넉히 쌓아놓도록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였다. 은행 등 일부 금융사에 적용하던 경영공시제도나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다른 금융권역으로 확대했다.
금융사 지배구조에도 칼을 댔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경우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또 금융사에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금융사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경영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2001년에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기업공시의 안방조회 시대'를 열었다. 전자공시시스템은 모든 공시사항을 전자 문서화해 누구나 이를 검색해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공시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금감원이나 증권거래소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를 전자문서화하면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에게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회계시스템에 혁명을 가져왔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공시 후에도 허위나 부실기재는 없는지,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은 없는지 조사해 공시위반여부를 심사하고 제재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금감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위험 관리자'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라며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찾 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잠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