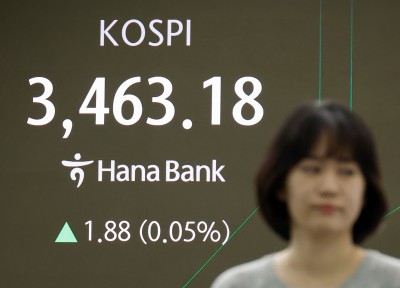입사자에게 '인보증'...구태 여전해
보험 등으로 대체됐지만 일부 기업서 관행처럼 요구
전문가 "위법 아니지만 없어져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기업들이 직원 채용 시 부모나 일가친척의 보증을 요구하는 '인보증'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 부담에 비해 실효성이 낮아 외환위기(IMF) 이후 보증보험 등으로 대체됐던 '인보험'을 아직 일부 기업이 강제해 '구시대적 관행'이란 지적이 나온다.
◆채용됐나 싶더니...“가족 인감으로 보증서라”
김모(27·남)씨는 지난달 말 모 법무사무소 취업에 성공하는 듯했다. 회사로부터 최종면접을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은 김씨는 구직난을 뚫고 직장을 잡았다는 기쁨에 날아갈 듯 기뻤다.
하지만 김씨는 이내 황당한 통보를 받고 어리둥절했다. 부모나 친척이 인감도장으로 신원보증을 서야 채용이 확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난감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김씨는 “그래도 다시 백수가 될 순 없었다”며 급한 대로 가족에게 부탁했다. 그렇지만 부모는 ‘연대보증’이란 말에 썩 달가운 표정이 아니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급해진 그는 사촌형과 큰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미안하지만 보증은 곤란하다”는 말뿐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몰려왔다. 이 일로 집안 식구들과 불화까지 생겼다. 김씨는 7일 현재까지도 보증을 설 사람을 찾지 못해 채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구시대적 신원보증제...보험으로 대체됐지만
신원보증은 고용계약 중 피사용자가 사용자에게 입힐지도 모르는 손해·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제3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과거 기업들은 직원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입사자에게 부모·친척·지인의 신원보증을 요구했다.
1980년대까지만해도 김씨 사례와 비슷한 일이 흔했다. 당시에는 아들이나 사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 부모가 대신 피해액을 갚아줬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제법 있었다.
이런 인보증 방식은 2000년대 들어 점차 사라졌다. 직원이 안아야할 금전적, 정신적 부담에 비해 실효성이 적고, 노사간 신뢰를 해친다는 우려에서다. IMF 직후인 1998년, 한국보증보험을 흡수 합병하면서 출범한 서울보증보험 등으로 대부분 대체됐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손해액을 대신 보상해주는 식이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와 제약회사, 일반영업회사 등에서 보증보험이 아닌 인보증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다. 지난 4월 모 중견기업 경영 직군에 취업한 A씨도 회사가 인보증을 강요해 한때 입사를 망설였다. 그는 “면접 자리에서 인보증 이야기를 해 당황했다”며 “매출이 수천억원이나 되는 회사가 보증보험은 거부하고 인보증만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이외에 1인은 보증보험, 1인은 인보증으로 총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게끔 하는 기업도 있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위법은 아니지만..."
일부 기업의 인보험 요구와 관련, 전문가들은 위법은 아니라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나 있던 구시대적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사영 노무사는 “피고용자 입장에선 꺼림칙하겠지만 실제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않고 신원보증만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근로기준법 상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설령 불법이 아니라 해도 이런 구태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