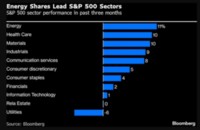[뉴스핌=정상호 기자] EBS1 '명의'가 암보다 무섭다는 혈액암을 조명한다.
26일 오후 9시50분에 방송하는 '명의'에서는 1990년대 초만 해도 손도 못쓰고 죽는 병이던 혈액암에 대해 알아본다.
이날 '명의'는 혈액암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혈액암과 싸우는 환자의 실제 이야기, 그리고 임상 연구 중인 최신 치료법까지 소개한다.
제작진이 만난 한 환우는 처음 혈액암을 단순한 감기 정도로 알았다고 털어놨다. 누우면 숨이 찼고 숨쉬기 불편해 단순 감기나 비염이겠거니 했던 그는 감기약 지어 먹고 2주가 지나고 열이 안 내리자 의심이 들었다. 코피가 안 멎고 배에 상처가 났는데 지혈이 안 됐다는 혈액암 환자도 적지 않다.
이처럼 혈액암은 병명은 친숙하지만 증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의학계에선 돌연변이 세포로 혈액에 이상이 올 뿐 아니라 림프절에 나타나는 종양까지 모두를 혈액암으로 정의한다.
'명의' 제작진과 만난 54세 환자 김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보호자는 당시 사망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고 돌아봤다. 급성 백혈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1년 이내 90%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환. 다행히 김 씨는 예후가 좋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이 병은 완치율이 약 80% 정도로 높다.
종류만 70여 개에 달하는 혈액암은 김씨 경우처럼 예후가 각각 다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호지킨 링프종 5년 생존율은 69.1%, 호지킨 림프종 5년 생존율은 80.6%다. 단순히 백혈병을 통틀어 보면, 5년 생존율은 51.1%로 뚝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혈액암을 일으키는 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한다면 앞으로 혈액암 질환 생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김원석 교수와 정철원 교수는 "종류가 많은 만큼 예후도 제각각이다. 병에 대해 정확하게 환자가 알아야 한다”며 "치료의 첫걸음은 환자가 자신의 병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아야 이기는 혈액암에 대한 모든 것은 26일 '명의'에서 공개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