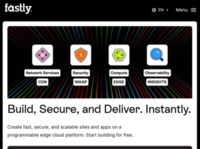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뉴스핌=김세혁 기자] 김성수 감독(55)과 배우 정우성(43)이 오랜만에 대박을 터뜨렸다. 개봉 닷새 만에 전국 180만 관객(2일, 영화진흥위원회 기준)을 모은 '아수라'로 말이다. 신작 '아수라'는 물고 물리는 악인들의 지옥도를 담은 범죄액션. '비트'(1977) '태양은 없다'(1998) '무사'(2001)에서 김성수 감독과 함께 한 정우성은 아내의 약값을 위해 악덕시장의 뒤를 봐주는 형사로 변신했다. '아수라'에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정우성은 19년 전 '비트'에서 폭주하는 20대를 열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런 그가 김성수 감독과 재회하면서 잠자던 '비트' 팬들이 깨어나고 있다. 우울한 눈빛으로 내일이 없는 청춘을 대변했던 정우성. 심장을 뛰게 하는 그의 '비트'를 들여다봤다.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
◆영화 ‘비트’의 기본정보
제목 : 비트(BEAT)
원작 : 비트(BEAT) 박하(글)·허영만(그림)
감독 : 김성수
제작 : 우노필름
출연 : 정우성, 유오성, 임창정, 고소영
스토리 : 방황하는 청년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죽음을 무릅쓴 복수를 그린 느와르
러닝타임 : 113분
배급 : 삼성영상사업단
등급 : 청소년관람불가

◆‘비트’의 주요 캐릭터
민(정우성) : 고등학생 시절부터 소문난 강심장. 주먹도 세고 잘생겨서 인기가 많다. 동급생 태수와 어울려다니며 전학 간 학교에서 환규와도 친해진다. 클럽에서 로미에게 10만원에 팔린 뒤 그에게 한없이 빠져들며 아픔을 겪는다. 싫은 건 죽어도 하지 않는 타입이다.
태수(유오성) : 민의 친구. 좀 더 빨리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싶어 고등학교를 자퇴, 조직원이 된다. 민의 부탁을 들어주는 등 친구에게는 살갑지만 조직원들에게는 엄하다. 큰 야망 탓에 위험한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친구 앞에선 웃음을 잃지 않는다. 전갈파의 습격으로 세상을 떠난다.
환규(임창정) : 민이 전학오기 전까지 학교를 잡고 있던 일진. 한 방에 민에게 나가떨어진 뒤 친구가 됐다. 분식집을 차려 보란듯 살아보려 했지만 폭력배들이 끼어들면서 일이 틀어진다. 설상가상으로 사기를 당하면서 교도소에 들어간다. 여자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민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린다.
로미(고소영) : 클럽 노예팅에서 10만원을 주고 정우성을 산 '비트'의 여주인공. 남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탓에 허세가 심하고 거짓말이 갈수록 는다. 제멋대로인 로미는 친구가 자신 때문에 목숨을 끊으면서 충격을 받고, 정신병원서 요양하지만 허언증은 낫지 않았다. '비트'의 정우성 팬들에게 로미는 안티의 대상이다.

◆정우성의 스타성 확인해준 아웃사이더 느와르
1997년 5월 개봉한 ‘비트’는 동명 만화를 스크린에 옮긴 화제작이다. 당시 유행했던 홍콩영화들, 일테면 '타락천사' '중경삼림'처럼 청춘을 소재로 하면서도 전혀 밝지 않고 어두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영화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정우성의 스타성을 확인해줬다. 1994년 영화 '구미호'로 데뷔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정우성은 '비트'를 통해 비슷한 세대의 우상으로 떠오르며 입지를 다지게 됐다. 당시 사회상은 젊은 세대, 특히 대학입시에 시달리는 고등학교 입시반에 무척 잔혹했다. 철저한 아웃사이더로 묘사되는 정우성은 반항아적 이미지로 학생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스타로 자리를 잡았다.

◆“나에겐 꿈이 없어”…영화 속 명대사
어디서 좀 놀았니? : 학교 옥상에서 정우성과 붙은 임창정이 당황해서 내뱉는 대사. 임창정은 나중에 출연한 영화 '두사부일체'에서도 이 대사를 써먹는다.
난 네가 좋아. 그러니까, 너도 대학에 가야해 : 1류만 고집하는 부모 탓에 로미는 자유분방한 삶과 엘리트 인생을 동시에 꿈꾼다. 이런 괴리는 이성이나 주변인물들에게도 강요되는데, 민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좋아하는 남자가 건달이길 원치 않았던 로미는 대학에 가자고 집요하게 설득한다.
저 소실점을 통과할 수는 없어. 다가갈 수록 멀어지지 : 학교나 로미 그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민의 대사. 태수가 건넨 바이크(혼다 DBR 600F) 뒤에 환규를 태우고 터널을 지나며 읊조린다.
태수야 난 냉면처럼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 : '비트'에서 민은 태수나 환규, 로미와 어울리는 것 외에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런 민 마저도 나방처럼 인생을 불태워 야망을 이루려는 태수가 걱정스러웠다. 태수네 가게에서 술을 진탕 마신 민은 태수를 염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에겐 꿈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 조직 보스 전갈에게 죽은 태수의 복수를 하려던 민 역시 칼을 맞고 쓰러진다. 새벽 한강변에 버려진 민은 편의점에 들러 빵과 아이스크림을 사오라는 로미의 음성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눈을 감는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던 현실과 끝내 어울리지 못한 민의 마지막 대사다.

◆영화 속에서 엿보는 시대상
영화 '비트'는 당시 시대상을 비교적 잘 담고 있다. 한창 불이 붙은 프로야구의 인기를 담은 장면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통신수단이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넘어가던 과정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특히 '비트'는 대학이 곧 성공이던 과열된 입시제도와 그 속에 갇힌 학생들의 피곤한 일상을 잘 담았다. 내신이 몇 등급인지, 대학은 갈 건지 고민하는 로미와 친구들 이야기가 어째 남 일 같지 않다. 심지어 밤늦게 학원 앞마다 장사진을 이루는 학부모들의 차량 행렬도 담고 있다.
이런 뒤틀린 시대상을 대변하는 인물이 로미다. 그는 민에게 대신 야구경기를 보게 한 뒤 상세한 내용을 전달 받는다. 그런 뒤 친구들 앞에서 공부는 안하고 바람쐬러 야구장에 갔다 왔다고 허세를 부린다. 결국 로미의 이런 태도는 친구 인경을 자살로 몰고 만다.
◆17대1부터 바이크 충돌까지…그 시절 청춘들에 끼친 영향
등급상 '비트'는 청소년이 접할 수 없는 영화였다. 하지만 어떻게든 작품을 감상한 청소년이나 젊은층은 정우성과 태수 등 멋진 주인공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닮기 바빴다.
그 중 손에 꼽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태수처럼 담배 필터를 일부러 떼고 피우는 사람들이 늘었다. 지포라이터도 크게 유행했다. 극중에서 민이 즐겨 피우는 담배도 인기를 얻었다.
가장 유명한 건 바이크 붐이다. 태수가 민에게 선물한 바이크는 당시 어린 학생이나 젊은층에게 최고의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다. 비록 혼다 CBR 600F는 아니더라도, 저마다 바이크를 타고 민의 행동(손 놓고 타는 장면)을 따라하다 부상을 입는 경우도 허다했다.(모 스포츠브랜드 광고에서 이종원이 의자를 타는 장면은 약과였다고)

◆‘비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
노예팅-로미와 민이 처음 만나는 장면. 민의 훤칠한 외모에 반한 로미는 10만원짜리 수표를 꺼내 들고 그를 사버린다.
태수 횟집 신-그때까지 민의 또래이자 같은 학생 신분으로 묶였던 태수가 비로소 달라보이기 시작하는 장면. 칼을 들고 횟집에 난입하는 태수는 이 때부터 주먹으로 성공하겠다며 야망에 불타오른다.
두 손 놓고 바이크 타는 신-민이 내신 7등급을 받자 모친은 상심해 잔소리를 한다. 모친이 만나는 남자에게 "우리 엄마 잘해주세요"라고 말한 민은 죽은 부친 사진을 들고 집을 나와 바이크를 몬다. 바이크 손잡이를 놓고 바람에 몸을 맡긴 민은 폭주 청년들의 우상으로 떠올랐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OST에 얽힌 웃지못할 사연
사실 '비트'는 음악이 빼어나거나 유명한 작품은 아니다. 다만 웃지못할 일화가 있는데, 그 유명한 밴드 비틀즈의 음악을 도용한 사실이다.
영화 초반, 노예팅에서 로미의 것이 된 민은 "난 비틀즈를 좋아해"란 말을 한다. 분명 영화 속에서는 비틀즈의 명곡 '렛 잇 비(Let it be)'가 흐르는데, 어찌된 일인지 편집을 거친 비디오판에선 음악이 쏙 빠졌다. 극장 상영 당시 비틀즈의 음악을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디오판에선 아예 삭제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