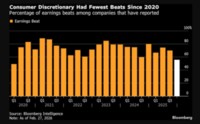연극 ‘스피킹 인 텅스(Speaking in Tongues)’에서 레온과 닉을 오가며 1인2역을 소화하는 강필석의 말이다. ‘스피킹 인 텅스’는 배우들로서는 두말할 것 없이 어려운 공연이다. 강필석은 “공연 초반에는 ‘빨리 끝났으면’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고백하며 멋쩍게 웃었다. 그 만큼 배우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상당했지만, 노력에 합당한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왔다. 세련되고 묵직한 연극의 완성이다.
호주 유명 극작가 앤드류 보벨의 대표작 ‘스피킹 인 텅스’가 호주 시드니 초연(1996년) 이후 20여 년 만에 아시아 초연 무대를 한국에서 갖게 됐다. 지난 달 개막한 이 작품은 오는 7월16일까지 대학로 수현재씨어터에서 공연한다.
연극에는 레온, 닉, 피트, 닐, 존, 쏘냐, 발레리, 제인, 사라 등 캐릭터 9명이 등장하고, 4명의 배우가 이를 연기한다. 강필석은 쏘냐의 남편이자 제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경찰 레온 역, 제인의 옆집에 사는 수상한(?) 남자 닉 역을 맡았다.

강필석은 작품을 소화하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캐릭터와 정서를 다 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피킹 인 텅스’는 9명의 등장인물이 서로 다른 드라마와 감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어우러져 하나의 묵직한 생각거리를 던지는 작품이다. 각 캐릭터가 작품 전체의 정서를 전달하기 보단,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소화하는 것이 관건. 그런 만큼 작품에 임하는 강필석의 자세는 정답으로 보인다.
2002년 연극 ‘하륵이야기’로 데뷔한 후 뮤지컬 ‘지킬앤하이드(2004)’ ‘유린타운(2005)’ ‘지저스크라이스트수퍼스타(2006)’ ‘쓰릴미(2007)’ ‘닥터 지바고(2012)’ 연극 ‘한여름밤의 꿈(2003)’ ‘레드(2011)’ 등 수많은 작품에서 기량을 떨쳐온 강필석이 이번 작품에 매력을 느낀 이유는 단순 명료했다.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형식이 굉장히 새롭고, 무척 섬세하더라고요. 툭툭 던져지는 이야기들이 탄탄하다고 느껴져 욕심이 났죠. 또, 처음 대본을 봤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 모든 캐릭터가 우리 근처에 실존하는 사람들이란 거였어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였죠. 닉의 감정을 저도 느껴본 적이 있고, 존이나 발레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모두가 어떤 결핍을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보시는 분들도 등장하는 캐릭터 모두에게 공감의 시선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식 자체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다른 작품은 눈 앞의 상대와 대사를 주고 받으면서 교감하는 게 있었는데, 일단 그런 게 없으니까요. 이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귀는 저쪽으로 가있고(웃음). 그날그날 호흡이나 감정에 따라 조금 다르게 대사를 칠 수 있을 텐데, 이 작품의 경우엔 또 다른 사람과 동시에 대사를 말해야 하니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다는 압박도 있었죠. 처음엔 정말 미로를 헤매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연기하면서 특히 힘들었어요.”
특히 강필석은 초반 연습을 떠올리며 “영혼이 박탈되는 느낌”이었다며 웃었다. 막이 오른 지도 어느덧 한달이 넘어선 시기. 지금의 그는 “이제 다른 배우들의 호흡을 서로가 배려하면서 적당히 잘 맞추고 있다”고 살짝 여유를 부렸다.
“지금은 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네요(웃음). 대본을 받았을 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연습 초반에는 차가운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작품이 가진 독특한 형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연기에 감정과 마음이 나오고부터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죠. 사실 (캐릭터에 대해서는)저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레온이 쏘냐와 다시 결합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닐이 무죄로 석방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레온은 다신 바람을 피울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의 결말에 대한 해석은 온전히 관객들의 몫이죠.”

“공연을 보고 생각이 많아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소통을 하고 있나?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나? 이 사람한테 내가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진 않나?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가령 혼자 그 때 일을 생각하다 갑자기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들이 오곤 하죠.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하고 쥐구멍에 숨고 싶고(웃음). 그러면서 변화가 찾아오죠. 이 연극이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요. 꼬이고 결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덩그러니 결말을 맞거든요. 따뜻한 감동을 주는 작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연극 자체가 그냥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연극을 보시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년 이상 활동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강필석이 ‘스피킹 인 텅스’로 배우로서 또 한번의 커다란 도약을 할 것은 명백해 보인다. 지나온 배우로서의 길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
“‘마음이 느껴지는 배우’로 남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도 표현에 대해서는 고민이에요. 친절하게 ‘나 지금 어떻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만약 어떤 직접적인 표현이 안 되더라도, 저의 어떤 마음이 객석까지 전달되는, 그런 배우로 남고 싶어요.”
[뉴스핌 Newspim] 글 장윤원 기자(yunwon@newspim.com)·사진 이형석 기자(hs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