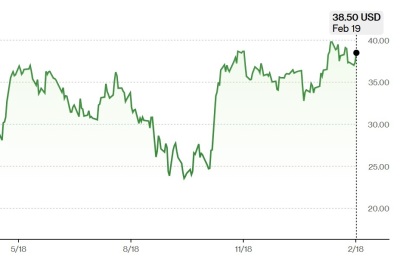[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자선사업가들이 '기부 활동'을 통해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단체들이 단순히 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에 자금줄을 대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27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가 세운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게이츠재단)의 벤처 관련 예산은 15억달러에 이른다.
게이츠재단은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그 회사의 주식을 받는다. 형식은 기부지만 사실상 벤처 캐피탈과 유사한 구조다.
주 투자 대상은 바이오테크 분야 기업이다. 바이오 기업은 기부재단의 투자를 받아 신약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기부재단은 이로써 질병 퇴치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미국 국세청(IRS)의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같은 벤처기업이라도 모바일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 분야보다는 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게 기부재단의 설립 목적에 훨씬 어울리는 것이다.
게이츠재단은 지난 2009년 이후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독일 바이오기업 큐어백(CureVac)에 역대 최고 액수인 5200만달러를 투자했다.
큐어백은 백신과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비상장 기업으로, 'mRNA'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인체가 광범위한 질병과 싸우기 위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백신과 약품을 저비용에 빨리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큐어백은 게이츠재단과 전염병 확산을 막는 백신을 공동 개발하는 데도 합의했다.
마이클 J. 폭스재단은 지난해 파킨슨병 치료 연구를 하는 기업들에 총 1700만달러를 투자했다. 폭스재단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바이오 분야 벤처기업에서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재단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학계에 묻혀버릴 수도 있는 의약품이 빨리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끔 돕는 것이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데보라 브룩스 폭스재단 공동설립자는 "초기에는 우리가 과학 기금 관련 사업 분야에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의 설립 목적이 '의약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룩스는 파킨슨병에 대한 블록버스터급 치료약이 지난 60년간 개발되지 않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만약 우리가 벤처 캐피탈리스트였다면,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은) 파킨슨병 치료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 중엔 기부재단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기부재단이 투자한 벤처기업이 신약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 막대한 기금을 낭비하는 셈인 데다, 설령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해도 이를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해서 환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기부재단처럼 비영리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 영리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서적으로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빛을 못 보고 묻히는 연구 결과가 허다한데, 기부재단이 적절한 투자자로 나서 시장화에 성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하버드대학교 경영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밥 포즌 MFS 인베스트 매니지먼트 전 회장은 "기부재단이 투자를 한 덕분에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의료 기관들이 무사히 신약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기부재단이 영리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이에 대한 지나친 편견도 어느 정도는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