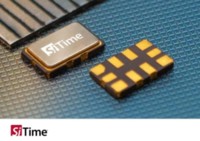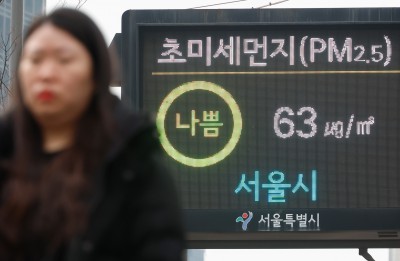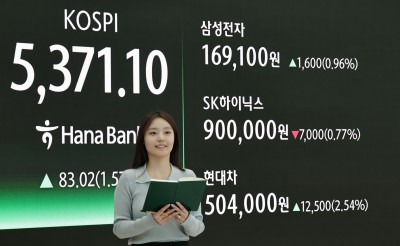국소적·선택적 암세포 파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아산병원은 동 병원 융합의학과 박정훈·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 가톨릭대학교 나건 교수팀이 스텐트를 치료 역할 목적의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광역학 치료용 카테터를 개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역학 치료는 빛을 받으면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광응답제를 혈관에 주입한 다음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照射)해 표적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으로, 식도암 환자 치료에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맥 주사를 통해 온몸으로 광응답제가 퍼지기 때문에 국소적인 치료가 어렵고, 빛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암실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빛을 쏘는 광섬유와 병변 간 거리 조절이 어려워 레이저를 고르게 조사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광응답제를 혈액에 주입하는 대신 내시경에 장착된 스텐트에 직접 코팅하고, 목표 부위에만 빛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스텐트 내부에 레이저 전용 통로를 만들어 기존 광역학 치료의 단점을 보완하고 식도암 치료 효과를 높였다.
연구팀은 먼저 혈액을 통해 주입하던 광응답제(Al-PcS4)를 스텐트에 직접 코팅했다. 기존처럼 광응답제가 전신에 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병변에만 국소적으로 광역학 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암실이 아닌 빛이 있는 곳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
광응답제를 코팅한 스텐트 내부에는 투명한 원통형 모양의 레이저 전용 통로를 만들었다. 기존 광역학 치료에서는 광섬유를 별도로 삽입했기 때문에 병변과 광섬유의 거리, 각도에 따라 빛의 세기와 조사 면적이 달라졌다. 연구팀은 스텐트 중심에 위치한 레이저 통로를 통해 균일하게 빛을 조사할 수 있고, 스텐트와 병변 간 거리가 일정해 치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텐트의 양 끝단을 카테터에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치료 후 곧바로 스텐트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스텐트의 장기간 거치로 인한 천공, 출혈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였다.
연구팀은 새로 개발한 광역학 치료용 카테터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식도암 이식 마우스와 토끼 모델을 통해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마우스 모델에서 종양 크기와 무게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 모델에서는 국소 광역학 치료 후 진행한 내시경과 조직검사 결과 점막 괴사와 섬유화 반응이 확인됐으며, 천공과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훈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광역학 치료용 카테터는 광응답제를 코팅한 스텐트를 활용해 종양을 국소적이고 파괴하고, 레이저를 고르게 조사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인다"며 "식도암 외에도 다른 비혈관 악성 종양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침습적 중재시술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도훈 교수는 "정맥주사 없이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카테터이기 때문에 전신 독성 없이 안전하게 식도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기존 표준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새로운 중재적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국제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스(Biomaterials, 피인용지수 12.8)'에 최근 게재됐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