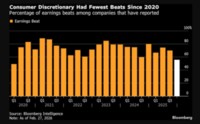[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어깨가 너무 아파요. 회사에서 산재 처리도 받았죠. 몇 날 며칠을 떼느라 쭈그려 고생했던 것을 떠올리면...어휴."

얼마 전 취재 차 만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역사에 붙인 스티커 제거 작업에 투입됐다던 그는 "아직도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며 연신 오른쪽 승모근을 눌러댔다. 시위자들이 붙인 스티커는 강력한 접착력으로 자국이 쉽게 남아 다른 시위 용품들보다 처리 시간도 배로 들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스티커 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은 독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전장연 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대규모 시위로 도로도 한동안 몸살을 앓았다. 시위자들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등 도로 곳곳에 끈적거리는 포스터를 붙였고, 방치해둔 탓에 며칠이 지나서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다. 시위 사흘 뒤 만난 청소 노동자는 "한 번에 다 치우긴 어렵다. 이런 때는 포스터를 치우는 팀도 따로 동원된다"며 이른 아침부터 시위 흔적을 치우기 바빴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 대체로 '공감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출퇴근길 역사와 길바닥에서 수시로 포스터들을 봐야 하는 시민들은 "공공재에 이렇게 하는 건 민폐 아니냐", "바닥도 미끄러워지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 보인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지난해 '집회·시위 기준 강화' 여부를 묻는 '제3차 국민 참여 토론'에선 찬성 수(71%)가 반대 수의 두 배를 넘기기도 했다.
결국 서교공 측은 이들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고, 전장연 관계자 3명은 지난 3일 검찰에 기소됐다. 일각에선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제지·고발이 '의도적 압박'이란 지적을 하기도 한다. 수사를 받게 함으로써 위협을 주고, 위축시켜 자연스레 표현의 자유를 줄여나가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집회·시위할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다른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도록 허락한다는 뜻은 아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집회 신고 건수를 기록한 만큼 올해도 많은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집회·시위 문화가 생기길 바란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