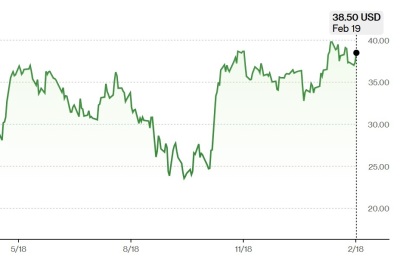[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대통령 못 해 먹겠다.” 2003년 5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돼 내뱉은 말이다. 정확한 발언은 “이러다간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생각에 위기감이 든다"였다.
직접적인 배경은 취임한 뒤 첫 미국방문(2003년 5월11~17일)을 마치고 돌아와 참석한 5·18 행사장에서의 해프닝에서 비롯됐다. 일부 대학생이 행사장에서 방미기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미 발언을 규탄했고, 이에 대해 5·18 단체 대표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사과를 하자 노 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송금 특검법,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임기초반부터 야당인 당시 한나라당과 대립과 갈등을 빚으며 정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으로도 해석됐다.
#탄핵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2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가 되자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을 만들어 국정을 돌파하는 고육책을 썼다.
제 19대 대선 후보들이 각종 장밋빛 공약을 내놓으며 ‘표몰이’를 하고 있지만 결국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공약 아래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을 위한 각종 법안을 내놓아도 현재 국회 구도 아래서는 ‘협치’ 없이는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핵심공약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19석 ▲자유한국당 93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33석 ▲정의당 6석 ▲무소속 8석 순이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헌법 제49조)이 요구된다. 현재 전체 재적의원수가 299명인 점을 감안하면 출석 150명에 찬성이 절반을 넘는 76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 국회 의석 구도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누가 되든 간에 이같은 조건을 만족할 정당은 없다. 여당이 다른 당과 협치를 통해야만 ‘나라가 굴러갈 수 있는 구조’다.
협치가 중요하지만 이뤄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경제정책에서부터 유력 대통령 당선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차이를 보인다.
안후보는 시장의 영역에서 정부보다는 민간과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는 공약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공약의 차이는 향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추진시 정당 사이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협치와 설득을 이뤄낼지 여부에 따라 성공의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사생결단식 경쟁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향후 봉합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기든 지든 간에 국가를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각 정당이 동의해줘야 새로운 대통령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