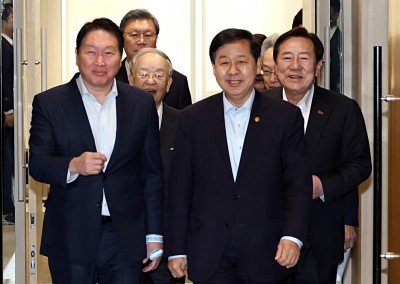[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6월 금리 인상 가능 여부가 달러화의 움직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로 하락한 달러 가치가 주는 경제적 수혜를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포기할 수 있을지가 6월 통화정책의 키를 쥐고 있다는 논리다.

19일(현지시간) 금융시장에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17% 상승한 95.242를 기록 중이다. 달러 가치는 전날 공개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3개월간 하락한 달러 가치는 다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주목받으면서 2주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4월 FOMC에서 대다수 위원은 경제지표가 개선세를 지속한다면 6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올해 단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를 뒤집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26%로 높여 잡았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달러 강세가 연준의 6월 결정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즉, 달러화 가치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연준이 6월 금리를 올리는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4년 중반부터 지난 1월 약 25%나 가치가 뛴 달러화는 미국 경제의 복병으로 지목돼 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편입 기업의 5분의 1가량은 적어도 절반의 매출을 해외에서 낸다. 결국, 달러 강세는 이들 기업의 실적 후퇴로 이어져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더글러스 보스위크 챕덜레인 FX 트레이딩 팀장은 블룸버그에 "연준은 손발이 묶여 있다"며 "연준은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를 의미하고 이것은 디플레이션 압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단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트 워싱턴 투자 자문의 닉 사르겐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연준은 지표에 달렸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금융시장 여건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에 시장에 의존적이기도 하다"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경제가 호전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그것은 달러화를 강하게 만들어 경제를 끌어내리고 주식시장을 약하게 만들어 역자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 가치 상승은 원자재 가격에도 부담을 준다. 전날 매파적인 연준의 의사록은 원유는 물론 구리와 금 등 원자재 가격의 후퇴에 다시 불을 붙였다.
FTN 파이낸셜의 짐 보글 이자율 전략 헤드는 "연준의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은 그들이 즐겼던 추세 일부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