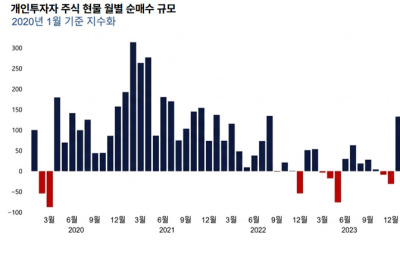|
[뉴스핌=장주연 기자] 1945년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배에 오른다. 하지만 그들이 탄 배가 도착한 곳은 군함도.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해 노동자로 착취하는 지옥섬이다.
영화 ‘군함도’는 탈출기다. 지옥섬 군함도에서 벗어나려는 조선인들의 각기 다른 사연이 한데 얽혀 펼쳐진다. 메가폰을 잡은 류승완 감독은 악단장 이강옥(황정민)부터 깡패 최칠성(소지섭), 광복군 박무영(송중기), 위안부 오말년(이정현), 어린 아이(김수안) 등 다양한 캐릭터로 ‘군함도’를 채웠다. 다만 이 모두가 중심인물이다 보니 이야기가 고루 담기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선명하게 그려놓은 건 이들의 탈출 목적이다. 박무영을 제외하고는 애국심에 들끓거나 정치적 이념을 가진 이가 없다. 독립보다 간절한 건 사람답게 사는 것. 탈출을 감행하는 이유 역시 가족애, 사랑, 분노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이자 본능적인 감정이다. 일제강점기 영화는 반드시 ‘국뽕’으로 귀결된다는 편견에서 비껴가는 첫 번째 지점이다.
이후로도 영화는 국수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한 ‘균형 잡기’를 계속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담백하지는 않다. 의미를 담은 시퀀스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 특히 탈출 직전 조선인들 손에 들린 초는 지난겨울 광화문 광장에 켜진 촛불과 맞닿는다. 의미 부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다만 이런 의미들이 쌓여 무거워질수록 재미는 반감된다. 아픈 역사를 다룬 작품에 재미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지만.
반제국주의 영화가 아니라 단정 지을 수 없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의미 부여. 류승완 감독은 반일 영화라는 시선에서 벗어나려 여러 설정을 더했다. 한국과 일본을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로 만들지 않은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반일 영화가 아니라면, 굳이 욱일승천기를 찢는다거나(물론 극중 욱일승천기를 찢는 이유는 생존이지만) 이미 타들어 가는 일본 우두머리의 목을 두 동강 낼 이유는 없었다.
 |
스케일이야 알려진 대로 역대급이다. 극초반 파도 너머 군함도의 윤곽이 드러날 때부터 선착장과 운동장, 지옥 계단, 번화한 유곽, 강제 징용이 이뤄지는 탄광 내외부, 조선인 식당, 일본인 직원 구락부까지 군함도 내 공간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구현했다.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분명한 공을 세웠다.
배우들의 연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하다. 황정민은 익숙한 얼굴을 또 한 번 노련하게 변주하며 극의 중심을 잡았다. 그런 황정민을 발판삼아 뛰어노는 김수안의 열연은 단연 ‘군함도’의 백미다. 전사를 쳐낸 탓인지 때때로 흐름은 끊기나, 이정현과 소지섭 역시 주어진 역할을 무리 없이 해냈다.
반면 송중기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롯이 그의 잘못은 아니지만, 전작 ‘태양의 후예’(2016)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연기가 몰입을 방해한다. 때문에 키플레이어 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긴장감이 떨어진다. 촬영 순서야 어찌 됐건 잘생기고 멋진 히어로는 유시진 대위로 충분했다. 오는 26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사진=CJ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