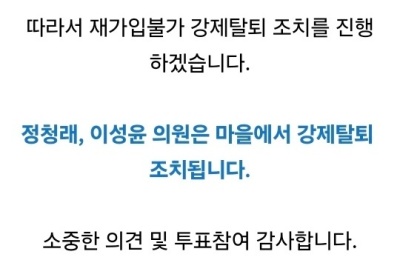[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지난해 선진국에서 프론티어마켓까지 글로벌 주요국의 중앙은행들 사이에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공조였다.
실제로 공조가 매끄럽게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최근 움직임에서 커다란 반전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전적으로 각국의 국내 상황에 적합한 통화정책에 집중한다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통화정책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자산 매입 축소에 이어 긴축 시기를 저울질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달리 유럽중앙은행(ECB)은 가까운 시일 안에 부양책을 추가로 실시할 여지가 높다.
일본은행(BOJ)은 최근까지 실시한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인 2%까지 끌어올리는 데 충분한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브라질과 남아공은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데 반해 헝가리와 이스라엘은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다. 캐나다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앞서 미국 연준은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글로벌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에 공조를 이룰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내 상황과 필요에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 사이에 실제 이 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셈이다.
외환부터 부동산까지 글로벌 자산시장이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한 만큼 특정 국가의 통화정책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금융위기 이후 5년 이상 지나는 사이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령, 유로존은 3월 인플레이션이 0.5%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디플레이션 리스크와 함께 주변국의 부채 부담이 높아질 여지가 높아졌다.
이와 달리 일본의 경우 장기 디플레이션 끝에 물가가 마침내 상승세로 반전했고, 내년 인플레이션이 1.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크림자치공화국 합병으로 인해 실물경기가 크게 꺾이는 한편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고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더욱 후퇴하고 있지만 부양책을 확대했다가는 자산 버블을 포함해 오히려 중장기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미국 연준의 선제적 가이드와 관련,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과 이때의 대응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버드대학의 마틴 펠드스타인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0%를 크게 넘어설 여지가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간과한 선제적 가이드는 반쪽짜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