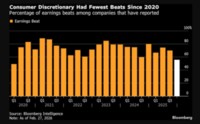롱지(longyi)를 입은 남자의 모습이다. 칸도지 호수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한데 앞의 풍경이 보기 좋아 셔터를 눌렀다. 나도 물론 롱지 즉 미얀마의 전통 의상인 치마를 입고 있다. 호텔에서 입을 때는 설레임이 일었는데 막상 입은채 시내로 나오려하니 쑥쓰러웠다. 용기를 내어 입고 나오자 선선한 바람이 마음 속으로 쳐들어오는듯 편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롱지를 입은 여자들의 모습 또한 아름답기 그지 없다. 쉐다곤 파고다나 보족 마켓, 양곤의 외곽을 도는 순환열차에서도 롱지를 입은 여자들의 자태가 내 눈을 절로 끌곤 했다.
고대엔 치마가 남녀 공용으로 입혀졌다고 한다. 바느질 기술이 발전되지 못한 것이 이유라고도 한다. 그러다가 바느질 기술이 늘어나고 남자들이 말을 타기 시작하면서 남자들은 치마 대신 바지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떠오르자 미얀마에서 치마 형태인 롱지를 전통적으로 내내 입고 있는 것에 마음이 더 갔다. 물론 이 나라가 무덥기에 치마 형태가 훨씬 실용적이며 편한 바가 있을 것이다. 남태평양의 피지 섬에도 남자들이 치마를 입는다는데 그 이유를 잘은 모르지만 미얀마와 통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암튼 인류의 고대의 의복인 동시에 미얀마의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치마 입은 남자를 역시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바라보는 마음은 멋쩍기는 하지만 유쾌한 일이었다.
]

롱지를 입고 버스를 타는 기분도 색달랐다. 이 나라의 버스 역시 순환열차와 마찬가지로 열악하지 짝이 없는데 나는 원시적인 의복을 입은 탓인지 그런 점이 오히려 반가웠다. 고물에는 첨단에 내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들어 있다. 고물상은 그런 점에서 소위 첨단이라는 것에 누락된 것들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고물상을 지날 때마다 저 고물들 속에 들어있는 보물들이 떠올려지곤 한다. 고물상을 그런 피상적인 환상으로 비약만 하는 것은 물론 무리이지만 말이다.
사진 속의 풍경은 물이 담긴 두 개의 양동이이다. 고물 버스의 차문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눈에 띄자마자 시큼하면서도 애틋하게 밀려오는 아지랑이 같은 것에 마음이 향긋하게 소용돌이 쳐졌다.
버스에 오르기 전에 봤는데 버스에 열이 오르면 그 물양동이를 들고 가서 물을 끼얹어 식힌다. 어릴 적에 많이 본 풍경이다. 물론 버스에 두명씩이나 타고 있는 조수들의 몫이다. 우리나라에선 오래 전에 사라진 조수이며 물 양동이이기에 목전에서 반짝일 때 아찔함과 함께 과거의 찬란 속으로 풍덩 빠지는 느낌이었다. 롱지를 입어서였는지 더욱 그랬다.

술레 파고다 부근의 정류장에 내렸다. 쉐다곤이나 보족 시장이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 더욱 걸으면 양곤 강이 펼쳐지며 그 너머에 섬이 존재하며 거기에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사진은 그곳으로 향하는 길가의 풍경이다.
각종 열대 과일들이 풍성하게 진열되어 있어 내 마음도 열대과일처럼 싱그럽고 탱탱해진다. 물건들을 사라는 아우성 소리와 삶이 소음들도 그득하다. 날씨는 무더워 파라솔과 그 그늘이 빚어내는 광경도 일품이다.

요란하고 떠들썩한 시장을 지나 강가로 가기 위해 육교 위에 올랐을 때 눈에 들어온 풍경이다.
방금 전의 풍경들과 대조되어 혼자만의 고독 속에 짐자전거를 타고 있어서인지 인상적으로 들어와 셔터를 눌렀다.
역시 롱지를 입고 있고 무더운 날씨 탓인지 밀집모자를 쓰고 있다. 앞으로 뻗은 길 앞에 횡으로 철로가 놓여 있어 길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저 막힌 길 앞에서 멈칫거리며 어딘가로 가야 한다.
짐칸에는 아무런 짐도 없어 마음이 허전할 것 같았다. 짐이 실리면 몸은 무거워지겠지만 무거운 삶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것이기에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어떤 선택이 주어지든 무거움이야 벗어날 수 없겠지만 육체의 고단이 그나마 나을 것이다.
빈 짐칸을 거느린채 길이 가로막는 길 앞에서 어디론가 가야하는 중년 짐꾼의 고독한 모습. 그것이 미얀마의 현실로도 날카롭게 상징되기도 하지만 그처럼 국가니 사회니 하는 거대한 범주들로 난처하게 환원되는 것도 보기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저 곳에 한 고독한 인간이 서성거리는 것이다. 서성일수록 삶은 무거워지기만 하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를 애타게 갈구하며 서성이는 것이다.

요란한 시장과 고독한 한 인간의 모습을 경과한 자리에 한 여자가 멀리서 나타난다. 그녀의 얼굴엔 뭔가가 발라져 있다. 다나까라고 불리는 천연 선크림이다. 말린 나무를 갈아 낸 가루에 물을 타 얼굴에 바르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롱지와 함께 양곤의 곳곳에서 넘치도록 보아왔다. 다만 이 여자가 지금 순간 매우 아름답게 보여서 다나까를 바른 모습이 더욱 인상적으로 보였는지도 모른다.
이번은 짧은 일정이었기에 내일이면 미얀마를 떠난다. 나라는 미물이 떠난 후에도 미얀마는 여전히 롱지와 다나까로 찰랑대겠지만 세상을 할퀴는 속도와 효율 위주의 매서운 바람에 의해 점점 떠밀려나갈 것이다. 롱지를 입는 사람들이 벌써 많이 줄고 청바지 같은 서구 타입의 옷을 젊은이들이 많이 즐겨 입는다고 한다. 좋은 화장품들이 이 나라의 얼굴들에서 저 천연의 색감 역시 지워나갈 것이다. 롱지를 입은채 마치 원시적인 풍광 속을 바람처럼 유랑하는 기분. 딱딱한 한국 사회에 들어가면 무척이나 그리울 것 같은 것, 이 나라에서도 서서히 멀어져 애잔함 속에서나 추억될 지도 모르는 것. 이처럼 진한 아쉬움을 머금은 미얀마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나만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무수한 사람들에게 소박한 질그릇 같은 여운을 주어온 서정의 시간이, 아시아의 오지라고 불리는 이 나라에서도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아 양곤 강을 향해 마지막 시간을 걷는 발길이 잘 떨어지질 않는다.
이명훈 (소설 ′작약도′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