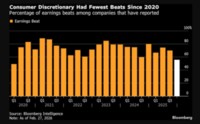이젠 동쪽이다. 에티오피아의 남쪽이 원시부족들로 유명하다면 동쪽은 무슬림의 유적들로 유명하다. 메카에서 발원된 무슬림은 동과 북으로 주로 퍼져나갔지만 홍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으로도 퍼진 것이다. 그 중심에 하라르(Harrar)라는 도시가 있다.
아디스아바바로 되돌아와 고원에 외길로 나 있는 도로를 500 킬로 미터 정도 달려 우리는 도착했다.
하라르. 이 도시는 나에겐 설레임의 장소이다. 무슬림의 성지라는 말을 듣기 이전에 시인 랭보의 체취가 묻은 곳으로 기억에 자리잡고 있다. 천재성과 광기로 물든 랭보가 고국 프랑스를 떠나 극심한 방랑 끝에 정착한 도시이니만큼 시를 갈구하던 내 마음의 한 구석을 마력으로 이끌어왔다. 그 도시의 골목을 거닐면서 우선 눈에 들어온 것은 알록달록한 색칠들이다.

“저 색들은 뭐지요?”
현지에서 구한 가이드에게 물었다.
“흰색은 평화, 그린은 번영, 블루는 관용, 핑크는 다양성을 뜻합니다.”
의미가 부여되자 한층 아름다워졌다.
“이탈리아군이 에티오피아를 침략해 이 도시에 주둔했을 때 칠했지요.”
그러나 뒤따르는 말에 씁쓸함과 함께 실망이 일었다. 저 칼라펄한 색조들과 거기서 번져나오는 야릇한 정감이 에티오피아 고유의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잔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에티오피아를 여행하면서 가장 감탄스러운 것이 이 나라의 정체성이었다. 어디에 기원을 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존감이 강한 나라였다. 가난과 정치적 후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윽하게 타오르는듯한 자존감은 존경스러운 것이었다. 그런 것이 아름다운 채색의 내막을 듣게 되자 도리어 훼손되는 느낌이 든 것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다채로운 색들로 장식된 이 마을은 현기증이 일 정도로 아름답다. 관능미마저 느끼며 골목 깊숙이 걸어들어가자 커다란 저택이 나타났다.

“랭보 뮤지엄입니다. 랭보가 살던 곳으로 추정되기도 하지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다. 안으로 들어서자 마음의 불길이 더욱 강렬해졌다.
랭보. 그는 이십대 초반의 나이에 시의 절정을 이루고는 시를 떠난다. 시에서의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유럽 문단에서 의미 있는 발자취가 된다. <악의 꽃>으로 유명한 보들레르에 이어 그는 상징시의 절대 미학을 보여주는 천재 시인으로 각광 받게 된다. 스물셋의 젊은 나이에 시를 끊은 그는 아프리카로 떠난 다음에 이 마을에 정착해 십년 정도 산다. 벽면에 붙은 주문서가 눈을 파고든다.
“랭보는 이곳에서 커피와 무기를 거래하며 살았지요. 저것은 그가 직접 쓴 주문서입니다.”
시를 쓰던 손으로 상업용 주문서를 쓰고 있다. 시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을까. 모른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고국과 시를 떠났고 아프리카라는 낯선 대지에 몸을 실었다.
무기 거래도 하고 커피도 팔았다. 실로 바람 같은 사람이었다. 그의 동성애 연인이었던 시인 베를렌이 지어준 별명으로는 <바람 구두를 신은 사나이>였다. 시인의 한 면모를 강하게 보여준 기인이었다. 그런 면에선 주문서를 쓰던 그의 손길에 시 따위는 남아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가 만신창이가 되어 고국으로 되돌아왔을 때 종이가 가득한 트렁크 하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불행하게도 그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트렁크는 과연 있었던 것이며 그렇다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문학사의 미스테리 중 하나이다. 랭보 자신은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 통증으로 부어올랐던 다리 하나를 잘림 당하고 그 얼마 후 암으로 죽는다. 그 미스테리의 트렁크만이 주문서를 쓰던 그의 손길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타히티가 고갱을 품은 섬이라면 하라르는 랭보를 품은 땅이다. 하지만 타히티가 고갱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의 의미를 지니듯 하라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도시는 랭보 이전에도 있어왔고 랭보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왔다. 마약이 잘 자라는 땅에 커피가 잘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이 도시는 마약성이 짙은 짜트(Chat)도 유명하고 커피로도 유명하다.

칼라펄한 도시의 골목골목이나 재래 시장의 그늘 속에 사진과 같은 짜트를 씹으며 행복에 겨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수시로 볼 수 있다. 그 눈요기 역시 이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 중의 하나이다.
짜트와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선 비슷한 범주의 기호 식품인 동시에 상극 관계에 놓여 있다. 짜트는 커피와 비교해 수확 기간도 빠르고 단가도 높아 농가에서 재배를 선호한다고 한다. 커피 재배를 그만두고 짜트 재배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렇게 되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마는 맛이 독특하게 좋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커피가 마약성의 짜트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에 내 가슴에 슬픈 먹구름이 인다. 좋아서라기보단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세계의 구조적 모순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데다가 그 결과는 세계인 모두에게 좋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복합적인 비극에 의해 퇴조되는 세계적 명품인 하라르 커피가 그런 역설로 인해 더욱 진한 맛으로 재음미 되는 사실에 텁텁한 뒷맛이 고인다.
그런 상념을 자아내는 이 도시가 이탈리아 사람들에 의해 색채가 입혀진 것이다. 16 세기에 무슬림 성전이 일어난 뒤로 무슬림의 주요 성지라는 칭송의 속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다. 아닌게 아니라 곳곳에 수많은 모스크들이 즐비하다.

문화는 그렇게 덧칠되고 삶은 지속된다. 겹겹의 문화 유산들이 전해주는 울림에 잠기는데 가이드의 말이 귓전을 울린다.
“에티오피아에선 당나귀와 여자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가 손짓하는 곳을 보니 풍경이 선연하다. 무거운 짐에 짓눌린 듯한 당나귀를 끌며 여인이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성지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소외의 소외를 살아가는 자들이어서 그런지 눈을 떼기가 어려웠다.

도시의 색조는 아이러니를 머금은채 아름답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의 색조의 마음들을 품고 있을 것이다. 짜트와 커피, 시심과 성스러움 같은 것들로만 대변될 수 없는 마음들이 이 도시를 오래 전부터 채워왔을 것이다.

그린빛 기둥의 대문에 쪼그려 앉아 있는 노인의 표정 하나에도 차마 해독되지 않는 깊이가 담겨 있다.
이명훈(소설 '작약도'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