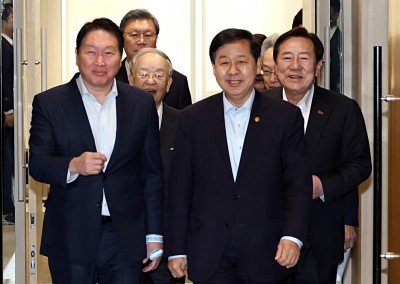[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이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적대적 세력에게는 이만한 법이 없습니다. 대항하려면 기업들은 그만큼 투자나 기술개발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기업가치 훼손은 커질 뿐이죠."
재계 자산순위 10위권의 한 그룹사 고위 관계자는 "미꾸라지 한마리가 우물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도록 길을 터주는 게 바로 이번 상법 개정안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너경영이 곧 기업의 경쟁력인 경영현실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는 법안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주주의 경영권,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부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는 기업 자율에 맞길 문제이지 강제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측면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비할 묘책이 거의 없다는 부분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로펌이나 투자은행(IB) 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현안 파악에 나선 상태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에 대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시도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999년 SK텔레콤과 타이거펀드, 2003년 SK와 소버린, 2004년 삼성물산과 헤르메스, 2006년 KT&G와 칼 아이칸 등 우리 기업과 해외펀드 간 경영권 분쟁사는 재계가 손꼽는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많게는 수조원, 적게는 수백억원의 뭉칫돈을 쏟아 부었다. 아울러 국내 소액주주들의 자국 기업에 대한 방어 동참도 적잖은 몫이 됐다. 왜 국민의 기업을 해외 해지펀드가 인수하려고 하냐는 지적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적대적 M&A는 대부분 무산됐지만 이들은 인수 실패 이후 주식 매각을 통해 수천억원 이상의 차익을 가졌다. 하지만 현재의 상법 개정안을 대입하면 단순한 차익실현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 모를 일이다.
M&A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악용될 소지를 충분히 수정·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입법화되면 앞으로 인수합병 공식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권이 농락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국계 투기자본 만큼이나 동종업계 외국계 경쟁사가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크게 우려하는 중이다. 합리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이나 기술마저 고스란히 경쟁사에 빼앗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도 경쟁사와의 분쟁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의 분쟁은 대표적이다. 이들의 분쟁은 이번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측의 분쟁은 지난 2004년 현대그룹과 KCC의 경영권 분쟁에서 출발한다. 당시 쉰들러가 양측을 접촉하면서 경영권 보호를 놓고 접촉했고, 현대엘리베이터와 합작회사 설립 LOI(의향서)를 맺고 현대그룹 경영권을 지켜주기로 합의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KCC가 5% 룰을 적용받으면서 현대그룹과 KCC의 경영권 분쟁은 자연스럽게 막을 내렸다. 현대 입장에서는 쉰들러와의 LOI 파기를 선택했다. 하지만 쉰들러 입장에서는 생각이 달랐다.
쉰들러는 KCC가 내다팔아야 하는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와 본격적인 분쟁에 돌입했다. 2010년에는 현대엘리베이터 보유지분을 크게 늘리며 35.37%의 지분율로 2대주주에 올라섰다.
올해 초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서 지분이 희석되면서 현재 30.9%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는 쉰들러는 여전히 2대주주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현대 쪽은 우호지분을 포함해 40%대 지분율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쉰들러는 2대주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현재로는 이사회 진출이 어려운 만큼 회계장부 열람이나 이사회회의록 열람 등을 요구하면서 소송전까지 빈번하게 불붙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현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쉰들러가 우호세력을 끌어들여 지분을 쪼개고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에 동종업계 경쟁사가 버젓이 발을 딪고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 수는 총 7명으로 이중 감사위원이 3명이다. 상법 개정안에 따라 쉰들러가 사실상 지분 쪼개기를 실시할 경우 이 감사위원의 수는 모조리 쉰들러 측 인사가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지분 30.9%를 보유한 쉰들러는 사내이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제도에 따라 최소한 1명 이상의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과반을 쉰들러 측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셈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쉰들러가 현대그룹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얘기도 된다. 현대엘리베이터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다. 물론 쉰들러 입장에서 이같은 방식을 고려할 지는 아직 추측에 불과하다.
다만 쉰들러는 글로벌 엘리베이터 업체로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직접 경쟁하는 상황이다. 만약 쉰들러가 현대의 경영권에 어떻게든 관여하게 된다면 국내 엘리베이터 1위 업체는 사실상 경쟁사에게 먹히게 되는 것.
결국 상법개정안을 통해 적대적 M&A가 이전보다 더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대적 세력과 지분 확보를 통한 주총의 표대결이였다면 상법 개정안 이후에는 제3자를 통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에 지분 쪼개기, 사외이사 장악을 기반으로 사내이사 선임 등이 선행될 수 있다"며 "지분 21%만 확보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내이사 1명 선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M&A를 당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업을 상장하고, 누가 기업을 키우려고 할 것이냐는 게 기업인들의 목소리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피땀을 흘려 만든 기업을 빼앗기느니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을 안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니냐"며 "사업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만들기보다는 적당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 경쟁력을 빼앗아 오는 것이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로 성장하면 대주주는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불안해 한다"면서 "주식소유자는 경영을 하면 안 된다는 개정안이 만든 이상한 법칙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