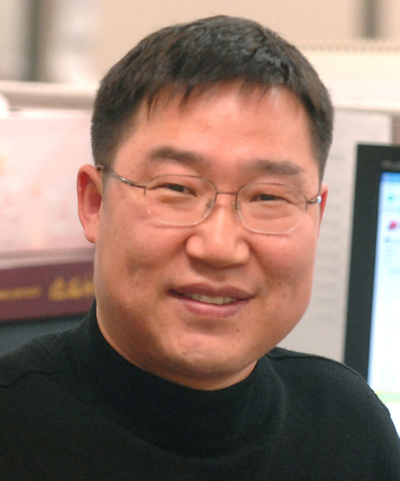까르르 웃다가 영정사진 찍을 때 엄숙 몰려와
수의입고 유언장 쓰자 밀려오는 내 삶의 후회
관 속에서 10분, ‘아무 것도 필요 없구나’ 절감
뚜껑 열리자 환한 빛 “주변에 감사한 마음 뿐”
[뉴스핌=황유미 기자] “기분 어때요?” 한 여대생에게 임종체험을 앞둔 기분을 묻자, 그는 기자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며 다른 친구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들의 웃음은 곧 있어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답지 않게 밝고 경쾌했다.
겨울이 훌쩍 다가온 지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효원힐링센터는 경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40여명으로 북적거렸다. 임종체험 직전 여대생들의 일상적인 대화와 웃음이 센터의 대기실을 가득 채웠다.
 |
| 1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효원힐링센터를 방문한 경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이들은 호스피스 수업의 일환으로 임종체험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 본격 체험에 앞서 신청서를 쓰는 모습. |
효원힐링센터는 2012년부터 죽음의 과정을 미리 느껴볼 수 있는 ‘힐다잉(임종)체험’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생명 존중과 가족·이웃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노년층 뿐만 아니라 학교·병원·봉사단체 등에서 체험을 위해 찾는다.
대학생들의 밝은 분위기는 대기실 오른편 영정사진을 촬영하는 코너로 가면서 잠시 사그라졌다. 기자 역시 카메라 앞에 앉으니 웃을 기분이 사라졌다.
‘내 마지막 사진이겠구나. 가장 나다운 모습을 남겨야할텐데’라는 생각이 스치자 얼굴이 굳고 어깨가 긴장되는 것이 느껴졌다. 죽은 뒤의 사진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
| 임종체험에 앞서 영정 사진을 찍는 기자의 모습. |
사진 촬영 직후 정용문 센터장의 강의가 이어졌다. 죽음의 의미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다.
강의에 첨부된 영상에는 말기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이 포함돼 있었다.
‘갑작스런 사고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게 삶’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음이 가깝게 와 닿았다. 부모님의 얼굴도 떠올랐다. ‘내가 만약 오늘 갑자기 죽으면 며칠 전 내가 낸 짜증이 부모님이 기억하는 나의 마지막 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기도 했다.
강의가 끝난 뒤 출력된 영정사진을 받아들고 임종체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딱딱하게 굳은 영정사진을 보자 ‘가족과 친구들 마음에 영원히 묻힐 사진인데 더 환하게 웃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강모(여·23)씨는 “마지막으로 남는 사진이고 잘 살았다는 뜻으로 더 웃고 찍을 걸 그랬다”며 멋쩍게 미소지었다.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지는 고요함. 조명이 없는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체험실의 문을 열자 50여개의 관과 촛불이 놓인 작은 탁자들이 보였다.
 |
| 임종체험실에 놓인 관과 영정사진 그리고 촛불. 체험시간 동안 영정사진 왼편에 있는 유언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따로 주어진다. |
수의를 입은 후 관을 왼편에 두고 한 탁자 앞에 자리잡았다. 촛불 뒤로 기자의 영정사진과 유언서를 세워뒀다. 앞쪽에서는 세월호 분향소를 찍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의 영정사진과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번갈아 보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듯, 죽음은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게 또한번 느껴졌다.
유언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10분 주어졌다. 막상 유서를 작성하려하니 어떤 말을 써야할지 막막했다.
가장 먼저 ‘후회’가 밀려왔다. 가족들을 더 아껴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데 따른 후회였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웬만큼 서운한 일들은 다 덮고 넘어갈 걸, 작은 일들은 짜증내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다. 내가 죽은 뒤 아파할 가족에 대한 걱정도 앞섰다.
다른 참가자들도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유언장을 가득 채웠다고 한다. 이어 유언장 낭독이 시작됐다. 하면 할수록 체험실 내 울음소리는 조금씩 커졌다.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엄마, 아빠, 오빠 잘 있어. 할 말이 많은데 이 한 장으로는 아쉬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 엄마야, 나는 아직 엄마에 대한 내 오해의 이야기를 풀지 못하고 엄마랑 여행 가보는 것도 못했는데 사실 이렇게 죽기가 아깝다.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가 이 마음을 몰라주는 게 나에게는 좀 한이 될 것 같아 무섭다. 그래도 할아버지처럼 우리 가족 곁에서 내가 머물며 지켜줄게.”
낭독이 끝난 후 관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뚜껑이 닫히고 ‘쾅쾅쾅’ 못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 속에는 내 몸 뿐이었다.
‘진짜, 죽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고사성어가 가슴 깊이 사무쳤다. 어둠 속에서 눈을 깜박거리며 유서를 적을 때 느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삶인데, 하루하루를 더욱 충실하고 주변에 감사하며 사는 것 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10분 뒤 관 뚜껑이 열렸다. 환한 빛이 쏟아졌다. 체험을 마친 이들의 표정은 체험 시작 전과 비슷하면서도 달라보였다. 누군가는 마음 한쪽의 짐이 덜어진 듯 가벼워 보이기도 했고, 다른 누군가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눈이 반짝이기도 했다.
 |
| 입관 체험이 시작되는 모습. 참가자들 모두 수의를 입고 관 속으로 들어가면 진행 도우미들이 관을 닫아준다. |
김보민(여·23)씨는 “임종체험을 해보니까 내 삶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고 제가 했어야 할 말을 이제야 찾을 수 있었어요. 유언서를 쓸 때 할 말을 정리하다보니 엄마나 언니한테 무슨 말을 가장 하고 싶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주변에 사랑과 감사함을 더 많이 표현해야겠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안한솔(여·23)씨도 “생각하고 고민할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죽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순서 필요없이 닥치는 대로 하나하나씩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효원힐링센터에서 진행되는 임종체험은 참가자들에게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자신이 언젠가는 죽는 존재임을 잊지 마라)를 깨닫게 했다. 영정사진을 찍고,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죽음을 느끼고 그를 통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정용문 효원힐링센터장은 “가족단위부터 범죄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힐링센터를 찾는다”며 “그 중에서도 아버지들이 오면 돈만 벌어다 주는 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가, 가족에게 소홀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돌아가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신 분들은 보통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던 인생이 시한부 인생임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겠다. 내가 가장 불행한 삶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삶이구나.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